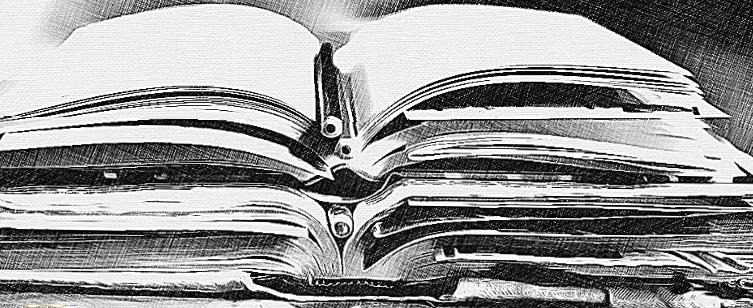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고전산문] 시속(時俗)에 아첨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그르다
일은 군자가 행한 것이라고 해서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성현(聖賢)이 논정(論定, 토론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결정함)한 것이라 해도 다 맞다고 할 수 없다. 대체로 일은 그때그때 벌어지므로 성인이 아니면 진선(盡善, 선을 다함, 온전한 선)할 수 없으며, 그게 지난 일이 되고 나서야 말깨나 하는 선비들도 다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에 종종 그 속내를 따져 보고 그 일을 들추어내어 자초지종을 규명한 뒤에 힘써 최고 극치의 이론(理論)을 펼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참견하거나 변명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후세의 선비가 어떤 이의 성공과 실패를 상고하여 논했더라도, 그 말이 성현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하여 다 그르게 여길 수는 없으리라.
나는 《맹자(孟子)》를 읽으면서 백리해(百里奚)의 일을 논한 대목*을 볼 때마다 의혹이 없지 않았다. 이 점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다. 신하 된 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결국 지혜와 술책이 많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위한 계책에 더 절실한 법이며, 직언하고 절개를 지키는 이는 항상 거칠고 솔직하며 소박하고 어눌한 사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군신 관계가 생긴 이래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충성을 다하여 잘못된 경우는 있지 않았다.
우(虞)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궁지기(宮之奇)는 간(諫)하였고 백리해는 간하지 않았다. 간한 것은 우나라가 망하는 게 두려워서였고, 간하지 않은 것은 우나라가 망하는 게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나라의 신하로서 우나라가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신하 된 사람으로 과연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하가 되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평소 임금을 섬길 때 어떻게 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아첨하면서 욕심을 유도하고 총애를 굳히며 녹봉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을 것이다.
백리해는 훌륭한 대부이므로 한때 간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번에 소인배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자(智者, 학식이 높고 슬기로운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사리에 통달하고 권도(權道)에 능하여 화란(禍亂)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고 허물이 없도록 처신하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시속에 아첨하거나 침묵하면서 제 몸과 집안을 건사하는 일에만 간절하고 자기 임금을 길 가는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면, 비록 관중(管仲), 안영(晏嬰), 장량(張良), 진평(陳平) 같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실은 천하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리해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까.
임금이 자기 신하에게 ‘자신은 간해도 소용없는 사람’임을 미리 알게 했으니, 우공(虞公)은 천하에 어리석은 임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리해가 벼슬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런데 이미 벼슬을 하였다면 간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간언하여 들어주지 않을 때 떠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떠나는 시점도 다른 때라면 가능해도 길을 빌려 달라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라의 존망이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실로 극력 간해야 마땅하며, 간해도 임금이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떠나지 말고 목숨을 바쳐야 옳은 것이다.(옮긴이 주: '길을 빌려달라는 상황'은 춘추좌씨전(春秋左傳 僖公 2年)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다. 기원전 655년 춘추 시대 때 진(晉) 나라의 순식(荀息)이 진 나라의 굴(屈) 땅에서 나는 말 네 마리를 우(虞) 나라에 주고 괵(虢) 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대부 궁지기(宮之寄)가 진(晉)나라의 계교를 알아채고 군주인 우공(虞公)에게 진나라의 청을 물리치라고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우공은 말을 탐내어 길을 빌려 주고서 오히려 진 나라의 선봉이 되어 함께 괵 나라를 쳤다. 그런데 진나라는 괵 나라를 함락한후 개선하여 회군하던 중에 우 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만다. 우나라의 군주 우공과 백리해(百里奚)는 포로가 되어 진나라로 잡혀갔다. 고사성어 '가도멸괵(假道滅虢)'의 유래가 되는 사건이다. 가도멸괵이란, '다른 나라의 길을 임시로 빌려 쓰다가 나중에 길을 빌려준 그 나라를 쳐서 없앰' 을 뜻하는 말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해 한 쪽이 망하면 다른 한 쪽도 화를 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과거 제국주의 세계 열강의 이해관계에 얽혀 청일전쟁이후 일사천리로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으로 조선이 망해버린 우리 역사도 이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 대치중인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적 상황도 여전하게 이와 비슷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사(子思)가 위(衛)나라에서 살 때 제(齊)나라가 침략해 온 일이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침략군이 오고 있는데, 어찌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자, 자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떠난다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나라를 지키겠는가.” 하였다. 이에 대해 맹자가 말하기를, “자사는 당시에 신하로 있었기에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백리해는 우나라의 신하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리고 백리해는 우공이 간해도 소용없는 임금임을 안 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백리해는 몇 년간 벼슬하는 동안에 요모조모 따져 보고는 경시하면서 임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지 오래였던 것이다. 임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나라가 망하느냐 않느냐가 무슨 문제 될 일이었겠는가.
백리해는 간해도 소용없는 임금이므로 간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줄만 알았지, 간해도 소용없는 임금의 나라에서 벼슬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런 백리해를 지혜롭다고 한다면 배구(裴矩)와 풍도(馮道)* 같은 무리가 앞으로 천하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아, 백리해의 마음을 확대시키면, 어리석은 임금을 섬길 때엔 반드시 “간해도 소용없다.” 할 것이며, 명철한 임금을 섬길 때엔 반드시 “간언할 일이 없다.” 할 것이니, 이는 결국 간할 수 있는 때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을 얻어 신하로 삼을 경우, 그 임금 역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역자 주]
1.백리해론(百里奚論) : 정양완은 매천이 〈백리해론〉을 쓴 이유를 언급하면서 “나라의 녹을 먹은 사대부로서 국망(國亡)에 이르기 전 미연(未然)에 방지 못한 큰 죄에다, 사리사욕에만 급급하여 국망은 아랑곳하지 않은 죄를 백리해라는 인물을 빌려 통렬히 논박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정양완, 散文을 통해서 본 梅泉의 文學精神, 震檀學報 61집, 1986》
2. 맹자(孟子)에 나오는 대목 : 백리해가 우(虞)나라에서 벼슬하고 있을 때, 진(晉)나라가 우나라에 이웃 나라를 치겠다는 명분으로 길을 빌려 달라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백리해가 끝내 길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간언하지 않고 우나라를 떠나 진(秦)나라로 감으로써 결국 우나라는 진나라에 멸망당하였다. 이에 대해, 맹자는 “우공(虞公)은 간해도 듣지 않을 인물이라 간하지 않았고 우공이 망할 줄을 알고 떠났으므로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매천은 백리해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3. 길을 빌려 달라는 상황: 당시 우(虞)나라는 강대국인 진(晉)나라가 괵(虢)나라를 친다는 명분으로 길을 빌려 달라고 협박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계략이었다. 《孟子 萬章上》
4. 배구(裴矩)와 풍도(馮道): 배구는 수 양제(隋煬帝)를 섬기다가 나중에 당(唐)나라에 귀순하여 민부 상서(民部尙書)까지 올랐던 인물이며, 풍도(馮道)는 오대(五代) 시대에 당(唐)ㆍ진(晉)ㆍ거란(契丹)ㆍ한(漢)ㆍ주(周) 등, 오조(五朝)의 재상을 지낸 인물이다. 여기서는 지조 없이 시류에 편승하여 변신을 거듭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말한다.
-황현(黃玹, 1855 ~1910), '백리해론(百里奚論)', 매천집(梅泉集)제6권/논(論)-
▲원글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 이기찬 (역) ┃ 2010
'고전산문 > 매천 황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전산문]정성을 다하여 할말을 분명하게 하되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된다 (0) | 2018.03.16 |
|---|---|
| [고전산문] 글의 요체는 얽매이지 말되 그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여 깨닫는 것 (0) | 2018.03.16 |
| [고전산문] 뜻은 추구하되 그 행적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0) | 2018.03.16 |
| [고전산문] 정부공사 총감독관 강복구(姜福九)씨 (0) | 2018.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