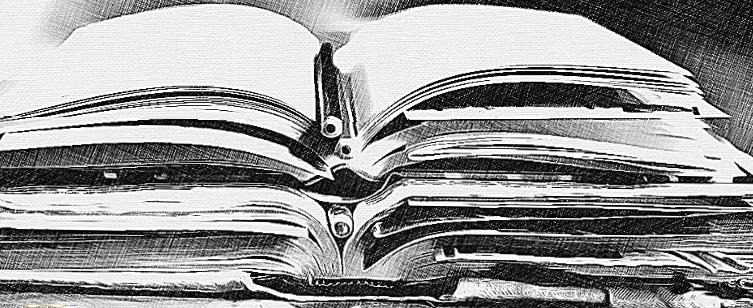빼어난 기운(氣運)이 없는 문인은 때주머니에 불과하다
경(經)ㆍ사(史)ㆍ자(子)ㆍ집(集)을 막론하고 첫권은 반드시 때묻고 빛깔이 바랬으며 심지어는 해어지고 떨어져서 읽을 수가 없다. 다음권부터 끝권까지는 비록 여러 해가 된 것이라도 씻은 듯이 말끔하다.
내가 항상 탄식하는 것은, 세상 선비들이 인내심이 적어 모든 글을 첫권을 읽을 때는 끝까지 읽을 것같이 하다가 오래지 않아서 게을러지고 싫증이 나면 이내 포기하여 제2권부터는 한 번도 눈으로 보거나 만지지도 않기 때문에 첫권과 끝권이 판연히 다른 물건같이 된다. 그리하여 쥐오줌에 더럽히지 않으면 좀이 먹게 되니 서적의 곤액(困厄)이 심한 점이다.
또 근자에 어떤 사람의 집에서 보았는데《패해(稗海)》1질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것같이 깨끗한데 《선실지(宣室志)》ㆍ《유양잡조(酉陽雜俎)》ㆍ《이문총록(異聞總錄)》등의 서적만은 모두 기름에 절고 손때가 묻은 것이 굴뚝 속에서 꺼낸 것처럼 해져 있었다. 이 서책은 모두 귀신과 꿈에 대하여 말해놓고 재앙과 별스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 이는 바로 식견이 없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고 하지마는 내가 일찍이 개탄하였다.
아, 천하의 일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부득이한 것도 있고, 감히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중인(中人) 이하는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또 조급한 자는 급히 서둘러 들어맞지 못하고 느린 자는 느려서 때를 잃는다. 이는 모두 이치에 따라 형세를 살피고 뜻을 편안히 하여 기운을 가라앉히지 못해서이니, 마침내는 패국(敗局)을 만들고 길이 탄식할 뿐이다.
내가, 이웃 늙은이가 쌀을 빻아 가루를 만드는 것을 고요히 보고 탄식하기를, “쇠절굿공이는 천하에서 지극히 강한 것이고 물에 젖은 쌀은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인데 지극히 강한 것으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을 짓찧으니 잠깐 사이 미세한 가루가 되는 것은 필연한 형세이다. 그러나 쇠절굿공이가 오래되면 닳아서 짧아지니 통쾌하게 이기는 자는 남모르는 모손(耗損,닳거나 줄어 없어짐)됨이 있다. 따라서 너무 강하고 굳센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기이하고 빼어난 기운이 없어지면 어떤 물건이고 모두 평범하게 된다. 산(山)은 이 기운이 없으면 깨어진 기왓장이고 물(水)은 이 기운이 없으면 썩은 오줌이다. 학사(學士)가 이 기운이 없으면 마른 풀을 묶어 놓은 것이고 방외(方外, 세속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가 이 기운이 없으면 진흙을 뭉쳐 놓은 것이다. 무부(武夫)가 이 기운이 없으면 밥통일 뿐이요, 문인(文人)에게 이 기운이 없으면 때 주머니이다. 충어(蟲魚)ㆍ화훼(花卉, 화초)ㆍ서화(書畵)ㆍ기즙(器汁, 그릇과 용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
영숙(靈淑, 신령하고 맑음)ㆍ정영(精英, 사물의 요체가 담긴 뛰어난 것)한 기운은 하늘이 모으고 땅이 기른 것이어서 이것을 얻는 자는 귀하니, 어찌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꿈치를 접하랴. 그러므로 먼저 밝은 두 눈으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며 또 사방을 돌아보아 이 기운이 줄고 왕성한 것을 살피면 삼라만상이 정상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상 밖의 표묘(縹緲,끝없이 넓거나 멀어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렴풋함)한 것과 의중(意中, 마음속)에 쌓인 것은 마음으로는 분명하나 입으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예부터 지(知)와 행(行)을 아울러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무슨 까닭인가? 민첩하고 빠른 자는 뿌리가 깊지 못하고, 굳고 확실한 자는 끝이 날카롭지 못하다. 그래서 모두 병통이 있다.
그러나 굳고 확실한 자의 고집과 과단이, 민첩하고 빠른 자의 공허와 쓸쓸함 보다는 낫다. 석공(石公)의 말에, “총명은 있고 담기(膽氣,사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력, 배짱)가 없으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담기가 있고 총명이 없으면 터득하여 깨닫지 못한다. 담(膽)이 많은 사람은 5분의 지식을 10분으로 쓸 수 있고, 담이 약한 자는 10분의 지식이 있으나 5분밖에 쓰지 못한다.” 하였다.
붓은 마른 대나무와 죽은 토끼털이요, 먹은 묵은 아교와 남은 그을음이요, 종이는 떨어진 삼베와 해진 천조각이요, 벼루는 오래된 기와와 낡은 쇳조각들인데 어떻게 사람의 정신(精神)과 생각처럼 측량할 수 없도록 변화하는 그런 조화를 부릴 수 있겠는가?
지금 붓ㆍ종이ㆍ먹ㆍ벼루를 가지고 혈육(血肉)의 심포(心包)와 굽혔다 폈다 하는 팔과 손가락, 그리고 탐탐(耽耽, 위엄 있게 주시하고 있는 모양)하게 보는 눈과 같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붓은 먹 같고, 먹은 종이 같고, 종이는 벼루 같고, 마음은 눈 같고, 눈은 팔뚝 같고, 팔뚝은 손가락 같다고 말한다면 비록 눈을 밝게 뜨고 깊이 생각하여 위아래로 살펴보아도 비슷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한 번 어떤 상태에 빠지고 모습이 촉발되어 만일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갑자기 눈이 움직이고 팔뚝이 꿈틀대며 손가락이 좇아서 잡는다. 벼루에는 먹이 갈리고 붓에 먹을 묻혀 종이에 쓸 때 종횡(縱橫)으로 써가고 좌우로 달려서 잠깐 사이에 들쭉날쭉한 글씨가 이루어진다. 기운(氣運)을 얻고 뜻이 마음에 가득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마음이 눈을 잊고, 눈은 팔뚝을 잊고, 팔뚝은 손가락을 잊고, 손가락은 먹을 잊고, 먹은 벼루를 잊고, 벼루는 붓을 잊고, 붓은 종이를 잊으니 이때에는 팔뚝과 손가락을 마음과 눈이라 하여도 되고, 붓과 종이 먹과 벼루를 마음과 눈 팔뚝과 손가락이라 하여도 되며, 먹과 벼루를 붓과 종이라 해도 된다.
마음이 고요히 안정되고 눈이 맑게 돌아와 팔뚝과 손가락을 소매 속에 거둔다. 그리고 먹을 닦고, 벼루를 씻고, 붓을 꽂고, 종이를 말아 둘 때는 잠깐 사이에 붓ㆍ종이ㆍ먹ㆍ벼루ㆍ마음ㆍ눈ㆍ팔뚝ㆍ손가락이 모두 본래대로 돌아간다. 또 전에 하던 일도 잊어버린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수용하면 과부(寡婦)의 방석[茵]과 효자(孝子)의 이불[衿]이 이상한 병에 효험이 있다. 기운이 서로 결합되고 또 서로 맞으면 초 나라 사람의 담과 월 나라 사람의 간이 함께 비쳐 같이 합할 수 있는 것을 알겠다.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48권 / 이목구심서 1(耳目口心書一) 중에서-
▲원글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 이식 (역) ┃ 1980
▲옮긴이 주
1.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수용하면, 과부의 방석과 효자의 이불~초나라 사람의 담과 월나라 사람의 간]: 과부의 방석과 효자의 이불이 효험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단정하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것들에 효험이 있다고 진심으로 간절히 믿고 집중하면 효험이 있을 수 있고, 견원지간인 초,월의 사람도 진심이 서로 통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비유의 말이다. 우스개 소리로 부러진 도끼자루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신령한 영물이 될 수도 있다. 여튼 이 문장은 먼저 전술된, '붓은 마른 대나무와 죽은 토끼털이요...' 이하의 글에 대한 결론 부분이다. 집중, 즉 몰아일체 상태의 요체를 비유한 말이다. 비록 생기없는 사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마음과 기운이 맞는 몰아일체의 상태가 되면 서로 생동하고 화합하는 것이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다. 너무 집착하여 치우치면 정신의 질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감정에 끌려 집착하다가도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 치장하는 엑세사리 갈아치우듯, 얼마 지나지 않아 감정의 약빨이 떨어지면 곧 시들해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듯이 외면해 버린다. 이덕무가 강조하는 것은, 취미든 독서든 글(문장)이든 예술이든 간에 기이하고 빼어난 기운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이다. 기이하고 빼어난 기운이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고 그만이 표현할 수 있는 확고하고 독특한 개성으로 봐도 무방하다. 자기만이 드러낼 수 있는 개성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확고하고 건강한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 집중과 끈기는 기운을 필요로 한다. 기운은 느낌으로 드러나고 전해진다. 곧 그것이 없으면 깨진 기왓장, 썩은 오줌, 밥통, 때주머니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뜻이 바르게 서 있다면 기이하고 빼어난 자기 기운을 먼저 도모하여, 이를 바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몰아일체가 되고, 비로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개치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할 때 아침다르고 저녁 다른 염량세태의 세속이 비록 모두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깨이고 열린 사람들이 흠모할만한 '벽(癖)' 으로써 흔들리지 얺고 변개치 않는 마음과, 정신을 살찌우는 진정한 운취가 된다는 것으로 나름 미루어 헤아려 본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가수 김수희가 부른 흘러간 대중가요 중에 나오는 가사다.
'고전산문 > 형암 이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비재기(知非齋記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안다는 것 (0) | 2017.12.20 |
|---|---|
| 모방한 문장(文章)과 가장한 도학(道學) (0) | 2017.12.20 |
| 천하에서 가장 민망스러운 것 (0) | 2017.12.20 |
| 교만과 망령됨을 경계하다 (0) | 2017.12.20 |
| 스스로의 경계를 삼다 (0) | 201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