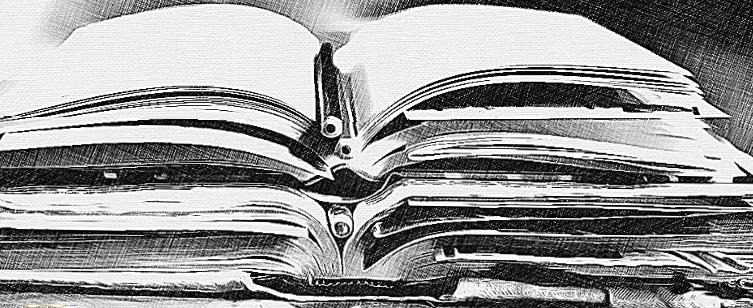입으로 과장된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지난번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담긴 뜻이 극진하였습니다. 소홀하게 답장하여 바람에 만분의 일도 부응하지 못하였으니, 거칠고 허술함이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보내신 편지는 가득한 수백 글자가 모두 진작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는 뜻이며 몸으로 터득하여 위로 통달한 공효였으니, 어둡고 나약하여 스스로 폐해 버림을 경계하는 사람에게 거의 수많은 재물을 보내 준 것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일컫는 것이 실상을 벗어나고 비유한 것이 걸맞지 않으니, 안절부절 부끄러운 마음에 차라리 도망가 듣고 싶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이 일에 전혀 뜻이 없는 자는 아니지만 뜻을 세운 것이 견고하지 못하고 마음 쓰는 것이 전일하지 못하여 의지할 만큼 힘을 얻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이는 먹어 늙고 정신은 혼미하며 식견은 짧아, 새로운 것은 어둡고 옛것은 더욱 아득하며 조금 진보하기는 하지만 퇴보하는 것은 날마다 더욱 커서, 이따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글퍼하니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깊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나이 먹어 늙은 것만을 보고서 왕왕 합당하지 않은 표제를 붙이니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대는 오래전부터 교유가 있어 나에게 조금의 장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근거 없는 말과 지나친 칭찬으로 크게 나를 높이고 있으니, 서로 학문을 갈고닦는 뜻이 아니며 도리어 곁에서 보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의 견해를 대략 전달하지만 이번의 편지는 반복하여 헤아린 것이 깊어 사람을 놀랍고 부끄럽게 만드니 감히 다시 읽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혹 이러한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스스로 살펴볼 때에 형편없는 나는 만분의 일도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세도(世道)가 쇠미(衰微)하고 온갖 거짓이 다투듯 일어나는 때에 우리들이 부족한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이 일에 뜻을 두었는데, 소문의 내용이 실제 얻어진 것이 아닌데도 근거 없는 명성이 이미 사방에 퍼져 버렸습니다. 설령 문을 닫고 들어앉아 자신을 수양하더라도 남에게 잘못 전달될 듯한데, 하물며 스스로 실상에 없는 말을 하여 서로 자랑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차갑게 쳐다보며 비웃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이와 함께 죄과에 빠지게 됩니다.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나 들으니 남과 자신은 마찬가지이고 안과 밖은 하나의 이치이니,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발현되며, 남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남을 대하고 밖으로 발현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안에 있는 것을 필시 응집하여 가지지 못할 것이며, 자신을 대하는 것을 필시 고요히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얻고는 쉽게 만족하여 축적과 확충의 공효가 부족하고, 깊은 곳을 굽어보며 높은 체하여 겸허와 사양의 맛이 없으니, 이 때문에 말과 글에 드러난 것이 대부분 광활하고 광대한 뜻이며 찬양하고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자상하고 간절히 서로 학문을 연마하며, 실제의 공부에 힘쓰고 실제의 병을 다스리는 뜻에는 조금도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사물의 변화에 응하고 말속에 함께 빠지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초래하여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어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수양하면 도리는 단지 평이하고 실질적인 곳에 있으니 무슨 헛되이 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학문하는 것은 단지 본분이니 어찌 차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오직 의리가 무궁하다는 것을 알아 중단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매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성찰이 깊으면 저절로 외면을 추구할 겨를이 없을 것이고 자신을 다스림이 세밀할수록 남을 대함에 있어 더 많은 여지가 있게 되어, 말과 일에 드러나는 것이 진실되어 헛됨이 없을 것이고 중후하여 깊은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유하고 강론할 때에는 '곧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덕과 의를 소중히 여기고 사사로운 고식(姑息, 당장에는 탈이 없도록 임시방편으로 둘러맞춤)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박하고 진실되게 마음을 쓰며 차츰차츰 진행해 가면 의지할 만한 실제의 터전이 있게 되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수양하고 실질에 힘쓰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는 있지만,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구하고 있어, 뜻이 보존되고 발현될 때에 혹 평이하고 실제적이며 도탑고 고요한 뜻에서는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모두를 말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어찌 이를 괴롭히는 것이라 여겨 의심하겠습니까.
사덕(四德)에 관한 의견을 이렇게 다시 분명히 알려 주었으니, 연구한 것이 정밀하였음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온당하지 못한 것은 별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결같이 형체가 없는 곳에서 구하고 있으니,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운 데서 생각하는〔近思〕 뜻이 아닌 듯합니다.
맹자가 사단(四端)으로 성(性)을 논한 것이 어찌 일상에 가깝고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마는, 정자(程子)는 오히려 “재주가 높아 의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문하에서는 인(仁)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를 회복하는 것〔克己復禮〕”, “경을 주장하고 서를 행하는 것〔主敬行恕〕”, “거처할 때에 공손하며〔居處恭〕, 일을 집행할 때에 공경하며〔執事敬〕,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심을 다하는 것〔與人忠〕”이라고만 하였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공부에 표준이 있고, 터전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양과 축적이 오래되면 표리(表裏)가 관통되고 체용(體用)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일상생활 속에서 천리(天理)가 유행하고 인(仁)의 본모습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회옹(晦翁) 선생이 남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급하여 왕왕 본체(本體)를 지적하여 제시하였으니, 〈옥산강의(玉山講義)〉*와 〈진기지(陳器之)에게 답한 편지〉에 이 뜻을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을 요긴함으로 삼고, 힘써 행할 것을 가까운 것으로 삼아야 하니, 그 뜻은 대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동정(動靜)을 분합(分合)하는 측면에서 세세히 분석하고 세밀히 살펴, 당연한 실체의 측면과 일상의 공부에 있어서는 분명하고도 근거할 만한 실제가 없으니, 오래되더라도 전혀 힘을 얻음이 없을 것이며 상상과 추측의 폐단에 공연히 시달릴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허와 실, 평탄과 험함의 구분이 단지 눈앞에 있게 되어, 또한 보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당숙(堂叔) 노형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충후(忠厚)함과 미더움은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이 들면 서글퍼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만사(輓詞)를 대강 적기는 하였으나 고인을 잘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사람을 알아본 것이 천근하였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마침 감기에 걸려 남의 손을 빌려 편지를 쓰자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나의 의견은 매우 두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니, 뜻을 품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의 터득에는 미치지 못한 채 서로 과시하고 내세워 남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으니,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신 편지도 이를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 말한 것인데, 말이 너무 직선적으로 된 듯합니다. 그러나 작은 인(仁)*은 큰 인(仁)의 적이며, 면목(面目) 없음이 장구(長久)한 인정(人情)입니다.
그대는 퇴도(退陶 이황) 선생의 〈김이정(金而精)에게 답한 편지〉*를 보았습니까? 절교의 편지를 써서 대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저 대현(大賢)께서도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스스로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감히 실상에 맞지 않는 말로 공연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공보(崔公普)와 최중구(崔仲久)*에게서 전날 편지가 왔는데 이 또한 한결같이 실질적이지 않고 허망하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미 답장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신뢰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용의 공부를 실제 터득한 사람은 입으로 과장된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 헛된 일을 하지 않아 저절로 이런 쓸데없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끝내 신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결코 전처럼 흔쾌히 종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만번 통렬히 살펴보십시오.(이하 별지別紙 생략)
[역자 주]
1. 김직보(金直甫) : 대산의 문인인 김종경(金宗敬, 1732~1785)을 가리킨다. 직보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호는 구재(苟齋)이다. 1774년(영조50) 문과에 급제하였다. 대산과 함께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를 편찬하였다. 《高山及門錄 卷1》
2.옥산강의(玉山講義) : 〈옥산강의〉는 주희가 옥산(玉山)에 머물 때에, 정공(程珙)의 ‘《논어》에서는 인(仁)을 말하였고, 《맹자》에서는 인의(仁義)를 겸하여 말한 것’에 대한 물음에 답한 내용이며, 〈진기지(陳器之)에게 답한 편지〉는 〈옥산강의〉에 대한 진식(陳埴)의 물음에 답한 내용이다. 주희는 이 글에서, 인(仁)은 부분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의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사단(四端)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은 인의 본체(本體)이고, 예(禮)는 인의 절문(節文)이고, 의(義)는 인의 단제(斷制)이고, 지(智)는 인의 분별(分別)이다.”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58 答陳器之, 卷74 玉山講義》
3.작은 인(仁) : 잘못된 점에 대해 엄하게 지적하여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것은 원래 주희가 왕자합(王子合)에게 답한 편지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두고 한 말인데, 이황(李滉)의 해석에 “배우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작은 인〔小仁〕이라 배우는 사람을 그르치게 하므로 큰 인〔大仁〕에 해롭다고 말한 것이며, 배우는 사람을 엄하게 대하면 면목은 없지만 학문은 크게 진보가 되므로 장구한 인정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49 答王子合》 《退溪集 卷11 答李仲久問目, 韓國文集叢刊 29輯》
4.퇴도(退陶): 퇴도는 이황의 호이고, 이정(而精)은 이황의 문인인 김취려(金就礪)의 자이다. 이황이 김취려에게 답한 편지에서, 이황 자신을 너무 높이고 본인도 높은 경지로 자처하였으며 또 가깝고 낮은 데서부터 학문에 종사하지 않음을 탓하면서, 절교의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위에서 말한 주희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른말로 인도할 책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설명하였다. 《退溪集 卷29 答金而精, 韓國文集叢刊 30輯》
5. 최공보(崔公普)와 최중구(崔仲久) : 대산의 문인인 최주진(崔周鎭, 1724~1763)과 최항진(崔恒鎭, 1738~1771)을 가리킨다. 이들이 대산을 태산북두(泰山北斗)에 비유하고 선생(先生)으로 지칭한 것을 나무랐으며, 평이하고 실질적인 데에서 공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때에 보낸 편지가 《대산집》 권16에 실려 있다.
**옮긴이 주: 옮긴 글에서 대산선생이 김직보의 학문이 진일보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며 김직보에게 다소 나무라는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 이유가 최공보와 최중구의 일화에서 드러나 있다. 추측컨대 평소에 김직보가 대산선생이 큰 학자, 대문장가이며 그런 대단한 그와 학문적인 교유를 나누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로 삼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선생은 겸손한 마음으로 학문하는 실질과 세상명성에 연연해하는 허망을 분명히 구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퇴도(이황)선생의 일화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평가나 칭찬의 말 또는 호의의 감정일지라도 헛된 희망이나 기대에 기초하여 지나치게 과장된 것은 언제든지 해악과 비방 또는 원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경험이기도 하다. 이에 대산선생의 식견과 인품의 깊이가 돋보인다.).
-김매순(金邁淳,1776~1840), '김직보에게 답함 기묘년(1759, 영조35)〔答金直甫 己卯〕',대산집(大山集) 제29권/ 서(書)-
▲원글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 이정원 (역) ┃ 2011
"남을 살펴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살펴보고(與其視人寧自視), 남에게서 듣기보다 차라리 자기의 소리를 들어라(與其聽人寧自聽)”-위백규<1727~1798, 좌우명 座右銘, 十歲/丙辰(1736년)>-
'고전산문 > 대산 김매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풍서기(風棲記): 세상 어디서나 바람은 분다 (0) | 2017.12.25 |
|---|---|
| 응객(應客): 의견의 병(病), 지기(志氣)의 병, 심술의 병 (0) | 2017.12.25 |
| 삼한의열녀전서(三韓義烈女傳序):글은 자기 뜻을 드러내는 것 (0) | 2017.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