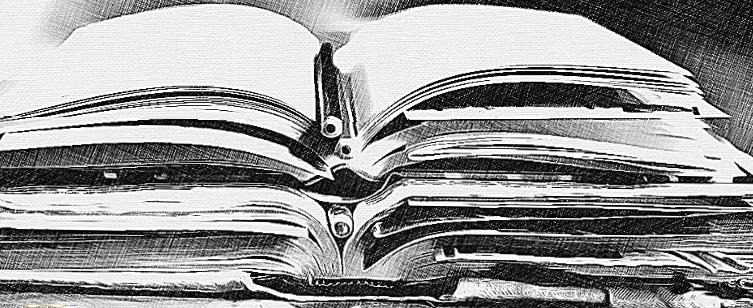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고전산문] 사람의 큰 병통(病痛)
(상략) 오직 성인(聖人)만이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으니, 성인(聖人)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다시 복구하면 그 잘못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게 되고 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복구할 경우에는 그 잘못이 이미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된 만큼, 복구해서 비록 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된 일은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서 곧바로 복구할 경우에는 그 잘못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기 전에 고치는 것이라서 애당초 후회할 일이 있게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좋고 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서 곧바로 복구하는 것은 두뇌가 명철(明哲)하면서도 의지가 강건(剛健)해야만 가능한 법이다.
무릇 잘못을 범하고서도 시간을 오래 끌게 되는 까닭은 그 기미(幾微, 낌새, 조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탓이요, 또 비록 잘못인 줄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욕(私欲)에 이끌린 나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탓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철하면 그 기미를 환히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될 것이요, 강건하면 사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끌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 제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중략)
내가 일찍이 거처하는 방에 ‘불복(不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문(記文)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자가 안자(顏子,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 안연(顔淵)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를 칭찬하기를, “선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일이 없었고, 그것을 알고 나서는 반복해서 행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대저 선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모르는 일이 없었던 것은 명철해서 잘 살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것을 알고 나서는 반복해서 행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용감해서 잘 고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병통(病痛, 깊이 뿌리박힌 잘못이나 허물등의 결점, 탈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살필 수가 없어서 그 일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명철해서 잘 살필 수가 있고 용감해서 잘 고칠 수 있는 것이 안자와 같다면, 선하지 못한 것을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그대로 놔둘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안자가 안자답게 된 소이라고 할 것이다.
선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지고 현인과 불초자(어리석은 사람)로 나뉘어지는 까닭은 오직 잘 살필 수 있느냐의 여부와 잘 고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잘 살피지 못하고 잘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천하의 큰 병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잘 살피는 면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가망(可望)이 있다고 할 것이니 그것을 알게 해 주면 혹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도 하겠지만, 이미 알고 나서도 고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가망이 없다고 할 것이니 그 경우는 선하지 못한 결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고치지 않는 데 따른 해로움이 또 가장 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학문에 뜻을 둔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이유를 깊이 추구해 보면 실로 이 두 가지 병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저 천하의 큰 병통을 내가 지니고 있었으니, 성취한 것이 없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였으니, 지금에 와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한다면 또한 이 정도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 어찌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고치지 않는 병통이 가장 심하기에, 나의 방에 ‘불복(不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안자가 반복해서 행하는 일이 없었던 것을 법도로 삼으려고 생각한다. 일단 벽에 써서 붙여 놓고 마음속으로 또 다짐을 하였으니, 지금부터 선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즉시로 분연히 일어나서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결연히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조익(趙翼1579 ~1655), '☞불원복장(不遠復章)' 중에서 부분 발췌, 포저집(浦渚集) 제18권/잡저(雜著)/심법(心法) 12장(章)/불원복장(不遠復章)
▲원글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4
※[옮긴이 주]
1. 불원복(不遠復):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오는 것(不遠復)을 뜻한다. 주역 복괘(復卦)의 초구(初九) 효사(爻辭)에 나온다. "初九(초구)는 不遠復(불원복)이라 无祗悔(무지회)니 元吉(원길) 하니라. 상왈(象曰) 불원지복(不遠之復)은 이수신야(以脩身也)라." 이에 관한 여러 역주들을 참조하여 나름 정리하면, "허물이나 잘못을 알았을 때 그 잘못된 것이 뿌리가 박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멀리 가지 않고, 즉시 바른 길로 되돌아 온다. 즉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허물과 잘못된 것들때문에 크게 오염되지 않았으니 크게 뉘우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결점이 오히려 좋은 경험과 교훈이 될 것이므로 크게 길하다. 멀리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는 것은 자기를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허물과 잘못은 싫든 나쁘든 악하든 간에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알 방법이 없다. 배움의 과정은 다른게 없다. 그 우선순위는 배움을 통해 자기 마음과 몸을 살피고 바르게 닦는 일이다. 자기를 살펴서, 드러난 그 허물이나 잘못들이 선하지 않고 바르지도 않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고쳐서 선하고 바른 것을 따를 따름이다". 윗글에서 포저 선생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고전산문 > 포저 조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전산문] 내 마음으로 남을 헤아려 판단해서는 안된다 (0) | 2017.12.30 |
|---|---|
| [고전산문]자송록(自訟錄) (0) | 2017.12.30 |
| [고전산문] 사람의 삶이란 여인숙의 나그네와 같은 것 (0) | 2017.12.30 |
| [고전산문] 역사는 모두 살펴보아야 마땅하다 (0) | 2017.12.30 |
| [고전산문] 사람 품격의 세가지 종류 (0) |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