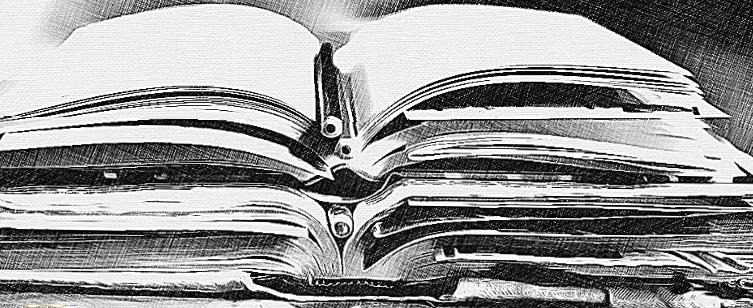벗에 대하여
붕우(朋友)는 다른 사람과 의(義)로 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명분이 있는 군신(君臣) 관계와는 다르다. 그런데 성인이 붕우를 부자(父子)와 함께 동렬에 놓고 오륜(五倫)으로 삼아 하늘의 질서라고 불렀고 다섯 가지 도리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세속의 생각으로 보면 매우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벗은 오상(五常 인ㆍ의ㆍ예ㆍ지ㆍ신)의 신(信)에 속하고, 신은 토(土)에 속한다. 오행(五行 목ㆍ화ㆍ토ㆍ금ㆍ수)은 토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오상(五常)은 신(信, 믿음, 신뢰)이 아니면 실질이 없다.
그래서 공자는 “벗을 통해 덕(德)에 도움을 받는다.〔友以輔德〕”라고 했고, 자사(子思)는 “어버이에게 순순한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벗에게 믿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으며, 증자(曾子)는 문왕(文王)이 공경하여 지극하게 머문 일을 열거하면서, 신(信)을 인(仁, 어짐, 인간됨)과 자(慈, 사랑)와 아울러 거론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듣고 난 뒤에 고칠 수 있지만 벗이 아니면 잘못에 대하여 들을 수 없고, 반드시 학문을 갈고 닦은 뒤에야 덕을 이룰 수 있는데 벗이 아니면 갈고 닦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자(父子)와 군신(君臣), 형제와 부부가 도탑고 차례가 있는 것은 모두 벗의 힘이다. 벗을 기다려 사륜(四倫)이 도타워지니, 벗이 사륜과 아울러 오륜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벗이 돕고 보태 주어 덕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부자 사이의 인, 군신 사이의 의(義), 부부 사이의 구별, 장유 사이의 차례 등이 모두 성실하지 못하다. 성실은 신이니, 그 어찌 사행(四行)의 토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단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서로 좋아했을 뿐이라면 그저 무리이지 벗이 아니다. 벗이란 것은 반드시 학업으로 교유하여 마음이 통하고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다. - 원문 빠짐 - 붕우라는 말은 총칭이다. 총칭했으니, ‘붕’은 바로 공자의 “널리 사람들을 사랑한다.〔汎愛衆〕”라는 말이며, ‘우’는 바로 공자의 “그리고 인한 사람과 친해야 한다.〔而親仁〕”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널리 사랑하는 일도 역시 믿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有信〕’고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해서 받들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벗이 아니며, 친구에게 부러운 점이 있어서 아첨하고 빌붙는 자는 벗이 아니다. 이 두 가지 교유는 벽을 뚫고 담장을 넘는 좀도둑보다도 부끄러운 짓이다. 잘못을 일러 주면 버럭 화내고 노여워하는 자는 벗이 아니며, 선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샘내는 자는 벗이 아니다. 이 두 가지 교유는 뱀이나 호랑이보다 두려워할 만하다.
좀도둑 같은 벗은 서로 헤진 짚신을 버리듯 할 것이며, 뱀이나 호랑이 같은 벗은 서로 해쳐서 함정에 빠트리고 돌을 던질 것이다. 마음이 같지 않은데도 어깨를 두드리고 소매를 잡으며 친한 척하는 자는 마음의 칼이 오구(吳鉤 굽은 모양의 칼)보다 날카롭고, 덕에 도움이 없는데도 달콤한 말과 뻔뻔한 낯을 하는 자는 정(情)의 끈이 노호(魯縞 얇은 고급 비단)보다도 얇다.
옛날에는 군자가 벗에게 바라던 것이 나에게 과실(過失)을 일러 주고 나를 덕과 의리로 권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우정이 물처럼 담백하지만 오랠수록 더욱 긴밀함을 깨달았고, 서로에 대한 공경이 손님 같았지만 오랠수록 더욱 보탬이 됨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벗이 살았을 때는 혈육처럼 미더웠고 벗이 죽었을 때는 애통하기가 수족(手足)을 잃은 듯했다. 이것이 바로 오륜에 들어갈 수 있는 벗이다.
“물고기가 넓은 강과 호수에서는 서로 잊는다.〔魚相忘於江湖〕”라고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 유유자적하다는 뜻이다. 이 한 구절이야말로 벗의 도리에 가장 잘 어울린다. 기미(氣味)가 맞아 마음으로 이해하고 정이 미더우니, 기실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허물이나 의심, 질투가 없다. 벗을 좋아하는 것은 사심이 아니고, 벗을 경책하는 것도 모질지 않다. 내 마음을 다하여 배려하고, 나아갈 길을 양보하여 보탬이 되게 하니, 권세와 이익 때문에 맺은 교유가 서로 이익을 바라면서 마음속이 늘 가로막혀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진정한 벗은 서로 잊은 듯 유유자적하기 때문에 오래가도 손상되지 않으니, 이러한 의리는 오직 도(道)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예부터 현명한 자는 적었고 불초한 자는 많았으니, 그 이유는 오직 자신의 잘못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에 대해 듣기 좋아하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혼미한 자는 밝아지며, 미혹한 자는 변별력을 갖게 된다. 잘못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요순(堯舜)을 아버지로 두고도 단주(丹朱 요의 아들)와 상균(商均 순의 아들)은 끝내 불초했고, 관룡방(關龍逄)과 비간(比干)을 신하로 두고도 걸주(桀紂)는 끝내 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벗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벗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듣기 때문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이 아닌 바에야 누군들 잘못이 없겠는가. 소소한 마음씨의 은미함과 행동의 실수에 대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경계할 수가 없다. 오직 벗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어 그 사특함을 막아 주고 말을 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으며, 시를 지어 성정(性情)을 착하게 하고 강론을 통해 식견과 지향을 키워 준다. 이렇게 물에 담그듯 향을 쏘이듯, 그렇게 되는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덕성을 이룬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울리는 사람이 모두 비루하게 아첨이나 하는 저급한 인물일 것이니, 본성이 날이 갈수록 망가지고 덕이 날이 갈수록 낮아져서 끝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저급한 벗은 나의 악행을 조장하고 나의 잘못을 편들어 주어, 나로 하여금 그 잘못을 반복하게 하고 나의 그릇됨을 미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간사하고 시기심 많은 한 부류는,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며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헐뜯으며, 남의 잘못을 엿보며 관찰하다가 들추어내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밖으로는 선(善)을 하도록 권한다는 명목에 가탁하지만, 안으로는 남을 해치는 독소를 퍼뜨리니, 이런 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편안히 받아들이고, 화를 내며 따지지 않는 것이 좋다. 편안히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해가 없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수신(修身)하는 경계에 보탬이 되지만, 화를 내고 따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도량에 방해가 된다.
성인(聖人)이 이미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라.〔無友不如己〕”라고 했으니, 내가 어리석고 못났다면 현자(賢者)는 반드시 나와 벗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현자와 친해지려는 정성을 더욱 도탑게 하고 잘못을 듣는 기쁨을 더욱 성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과 지혜가 날로 열리고 덕과 의리가 점차 진보하면, 거칠었던 자로(子路)도 마침내 안연(顔淵)이나 민자건(閔子蹇)의 외우(畏友)가 된다.
또래 벗들이 만나면 매번 농지거리를 일삼고 부모를 범하는 일을 재미로 삼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경하는 태도는 갖되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이 버릇이 습속이 되어, 농담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내가 남의 부모를 모욕하면 그도 나의 부모를 모욕할 것이니, 이는 스스로 자기 부모를 욕보이는 것과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비루한 습속으로 서로 희롱하는 자는 처첩(妻妾)을 두고 서로 희롱한다.
남녀의 분별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한계이며, 벗의 아내와는 바로 수숙(嫂叔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 사이)의 의리가 있으니, 어찌 말로 침해할 수 있겠는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남이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고, 남이 호의를 다 바치기를 바라는 것은 온전한 교유에 가장 해가 된다. 소인의 벗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이유는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종리매(鍾離昧)가 한신(韓信)에게 귀의하자 한신이 받아들여 살려 주었다가 끝내 죽여서 바쳤으니, 한 가지 일로 붕우와 군신의 의리를 둘 다 잃었다. 종리매가 와서 귀의했으니 한신은 그를 살려 주되 감히 임금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의리를 일러주고, 황제에게 글을 올려 종리매를 보호하고 밝혀 주기를 “항왕(項王 항우)의 신하들은 모두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유독 종리매만 처음부터 끝까지 두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각각 섬기는 대상은 달랐지만, 제가 폐하를 섬기는 것이나 종리매가 항왕을 섬겼던 것은 그 의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에게 종리매가 귀의하여 왔으나 제가 감히 사사로이 비호할 수 없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그의 죄를 용서하고 사형에 처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면, 고조(高祖 유방(劉邦))가 계포(季布)를 죽이지 않았던 넓은 도량으로 허락하고 사면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불행히 고조가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옛 친구의 정으로 보면 불쌍하지만 군신 사이에 감히 의심하고 가릴 수가 있겠는가. 울면서 종리매에게 어쩔 수 없는 뜻을 이야기하고 장안(長安)으로 보내서 종리매가 혹시 자백했다면 더욱 다행이었을 것이다. 또 불행히 죽음을 당하더라도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고 그 처자식을 구휼해 주었다면, 군신과 붕우의 도리 둘 다 온전하고 흠결이 없었을 것이다. 또 황제가 한신을 의심했던 마음도 이로써 풀리고, 일가가 남김없이 멸족되는 불행을 벗어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다. 의리에 밝지 못하면서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자는 일처리가 매번 이와 같으니, 어찌 한신만 그러하겠는가.
재화를 욕심내는 자, 부귀를 부러워하는 자, 권세에 빌붙는 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뽐내는 자, 시대의 풍조를 애써 좇는 자, 잡스러운 사람들과 교유를 맺는 자, 관청에 소송을 즐기는 자,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꾸미는 자, 관장(官長)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언어가 들뜨고 허황된 자, 남에게 아첨하며 기분 좋게 하는 자 등은 모두 벗으로 삼아서는 안 되니, 재앙이 반드시 내 몸에 미친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 '붕우(朋友)', 「존재집(存齋集) 제13권/ 잡저(雜著)/ 격물설(格物說)/ 사물(事物)」 중에서 부분-
▲원글출처: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오항녕 (역) ┃ 2013
'고전산문 > 존재 위백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칠정(七情):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0) | 2017.12.21 |
|---|---|
| 팔창(八娼)ㆍ구유(九儒)ㆍ십개(十丐) (0) | 2017.12.21 |
| 편벽됨을 치유하는 방법은 서(恕)뿐이다 (0) | 2017.12.21 |
| 마음을 비운다는 것에 대하여 (0) | 2017.12.21 |
| 두려워하는게 없는 자는 못하는 짓이 없다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