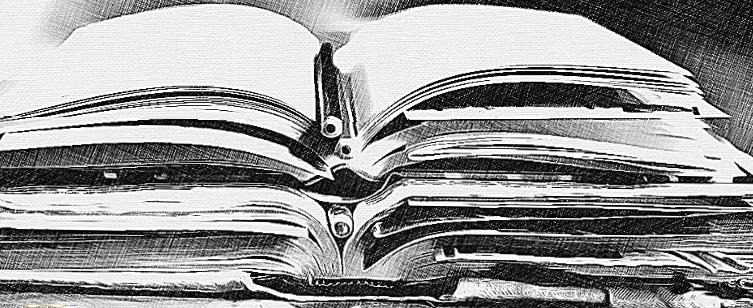팔창(八娼)ㆍ구유(九儒)ㆍ십개(十丐)
선비가 두루 달통한 학자나 온전한 인재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마음에 악이 없고 불선(不善)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재주가 한 방면에 적용할 만한 뛰어난 장점이 있으면, 모두가 성인에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공자 문하의 여러 제자 중에서 안연(顔淵)과 증삼(曾參) 외에 완전히 갖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육예(六藝,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에 능통했던 72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만 3000명이나 되는 제자 중에서 어찌 화락하며 조용히 선을 좋아하고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그들이 머리에 쓰고 몸에 입은 모자와 옷도 선비들이 입는 큰 옷에 큰 띠였을 것이다. 다만 소자가 말했던 ‘총명(聰明)한 남자’란 '쓸모가 있는 남자(男子之有用者)'라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옛 역사에 순 임금을 칭송하여 이르기를 “요 임금은 그가 총명(聰明)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으니, 순의 큰 덕이 있었지만 요가 천거한 것은 총명(聰明) 때문이다. 총명이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공자가 말했던 “세 귀퉁이를 반증하지 못한다”는 말이다.그러니 칠십 제자 이외에는 비록 팔삭(八索)과 구구(九丘)(역자 註: 상고 시대의 서책으로 팔삭은 팔괘(八卦)에 대한 설을 기록한 글이고, 구구는 구주(九州)의 토지에서 생산하는 물건과 그 지방 풍속들을 모아 기록한 글이다.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를 다 읽었더라도 모두 세 귀퉁이로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다면 아무리 본심에 악이 없더라도 끝내 극악한 큰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으니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옮긴이 註: 인용된 말은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말로 전체 문장은, “알고 싶어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고, 표현을 못해 더듬거리거나 답답해하지 않으면 말을 거들어 도와주지 않는다. 또한 한 귀퉁이를 가르쳐주어 나머지 세 귀퉁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이상 가르치지 않는다.”이다. 따라서 문맥상, 말하고자하는 의미는, "현명하고 밝은 사람은 마땅히 힘써 이성적 도리를 따라 다스림(應用)을 아는 지혜에도 능히 이르게 된다"로 이해하면 되겠다. 동시에 재능과 기예는 부가적인 것일 뿐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또 인간은 만물 중에서 신령스러움을 가진 존재로서 세 귀퉁이로 대답하지 못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자이다. 세 귀퉁이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시비를 판단하지 못할 것이고, 시비를 판단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백성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가장 신령스러운들 무엇하겠는가? 십철(十哲, 공자문하의 뛰어난 10제자, 안회(顔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유(冉有), 자로(子路), 자유(子游), 자하(子夏))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자가 원헌(元憲)을 재(宰)로 삼았고, 자고(子羔 고시(高柴))는 계씨(季氏)의 재(宰)가 되었으며, 칠조개(漆雕開)에게 관직에 나가라고 했고, 공서화(公西華 자화(子華))는 소상(小相)에 충분하다고 했으니, 그들의 인물됨을 모두 알 만하다.
예(禮)와 악(樂)에 통달하는 것은 선비의 직무이고, 활쏘기와 수레몰이에 통달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며, 서(書)와 수(數)에 통달하는 것은 남자의 기예이다. 이 모두 총민하고 통달하여 빼어난 기운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 한비(馯臂)와 공손룡(公孫龍)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용렬하고 가벼운 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만일 요순의 시대를 만났다면 모두 구덕(九德)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었다.
후세 유학자의 경우, 그들이 총민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은 단지 글귀나 따다가 문장을 짓는 일뿐이다. 퇴지(退之 한유(韓愈))가 장적(張籍)을 이 절동(李浙東)에게 천거하면서 단지 그가 고시(古詩)를 잘한다고만 했으니, 그 고시를 어디에 쓰겠는가?〈새하곡(塞下曲)〉이나 〈정부사(征婦詞)〉를 날마다 백 편씩 짓더라도 종이와 붓만 낭비할 뿐이고, 그 소리와 음률을 입힌들 다만 상간(桑間) 복상(濮上)의 남은 음악일 뿐이니, 공자가 깎아 낸다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곧 이른바 “수(數, 숫자)를 가지고도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을 줄을 모르니, 묶어서 높은 데에 치워 놓고 쓰지 않는다(셈법을 모르니 실생활에서 아무 쓸모가 없음을 뜻함).”라는 경우이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시(詩)란 이보다 못한 것임에랴. 이 때문에 우활한 유학자, 왜곡하는 유학자, 썩은 유학자라는 이름을 끝내 면치 못한다.
마침내 원(元)나라 세조(世祖)에 이르러 팔창(八娼)ㆍ구유(九儒)ㆍ십개(十丐)라고 헤아려 가며 순서를 매겼으니, 아아, 통탄할 일이다. - 그 실제를 따져 보면 재예(才藝)가 쓸 만하지만, 사실 광대나 창기보다 못한 자가 많았다. 이 때문에 천하 남자들을 욕되게 했으니 통탄할 일이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존재집(存齋集) 제13권/ 잡저(雜著)/ 격물설(格物說)/ 사물(事物)」 중에서 부분-
"사람에게는 덕이 있고, 행실이 있고, 도량이 있고, 재능이 있고, 언변이 있고, 용모(바른 몸가짐)가 있고, 문장이 있는데, 전부 갖춘 사람은 성인(聖人)이고, 그다음은 현인(賢人)이며, 그다음은 선인(善人)이다. 용모와 문장만 가지고 있어도 남들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중 하나도 없으면서 자칭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자칭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남들도 그를 사람이라고 인정하니 이상한 일이다." -위백규('사람', 존재집 14권 잡저/격물설)
▲원글출처: 한국고전번역원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오항녕 (역) ┃ 2013
**옮긴이 註: "팔창(八娼)ㆍ구유(九儒)ㆍ십개(十丐)" : 원래 이 말의 출전은 몽고에 멸망된 북송의 화가, 시인인 정사초(鄭思肖)의 글, 대의략서(大義略敍)이다. 고사성어 구유십개(九儒十丐)의 출전인 그 기록에 의하면, 수렵유목민족인 타타르인들의 직업선호도를 1관(官), 2리(吏), 3승(僧), 4도(道, 도교의 도사), 5의(醫), 6공(工, 장인), 7렵(獵, 수렵인), 8민(民), 9유(儒), 10개(丐, 거지)의 순서라고 순위를 매겼다. 자료를 찾아보니 설에 의하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던 원 세조인 쿠빌라이가 이를 빌어서 "팔창(八娼)구유(九儒)십개(十丐)라 하여 유학자를 몸파는 창기보다 못하고 거지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으로 등급을 매겨 멸시하고 비웃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원나라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중국 고유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다문화정책을 펼치되 지배계층인 몽골족만은 한족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종교와 학자들에 대해서도 배타적이 아니라서 또 제국의 특성상 타문화권의 종교와 학문까지도 대다수 허용했다. 다만 한족의 반란을 경계하여 민족차별, 즉 엄격한 정치 사회적 신분차별과 감시체계를 두었는데, 1몽골족-2색목족(터키,아랍, 이란등의 서역인)-3한족(화북)-4남인(남송)이 그것이다. 따라서 구유십개의 고사성어의 바탕에는 역설적이게도 반몽정서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 즉 몽고가 유학이라는 고급정신문화를 가진 중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반몽정서를 자극하고 역설적으로 몽고민족을 야만시하는 반감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유학과 학자를 천시하는 민족이 바로 쿠빌라이로 대표하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몽고인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위백규 선생이 유학자로써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인용구를 직접 거론하면서 변론하는 대신에 오히려 현실적 비판과 동시에 자성과 통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의 학자적 지성의 양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 선생의 개탄(慨歎)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전산문 > 존재 위백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미를 취하되 문장을 흉내내지 않는다 (0) | 2017.12.21 |
|---|---|
| 칠정(七情):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0) | 2017.12.21 |
| 벗에 대하여 (0) | 2017.12.21 |
| 편벽됨을 치유하는 방법은 서(恕)뿐이다 (0) | 2017.12.21 |
| 마음을 비운다는 것에 대하여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