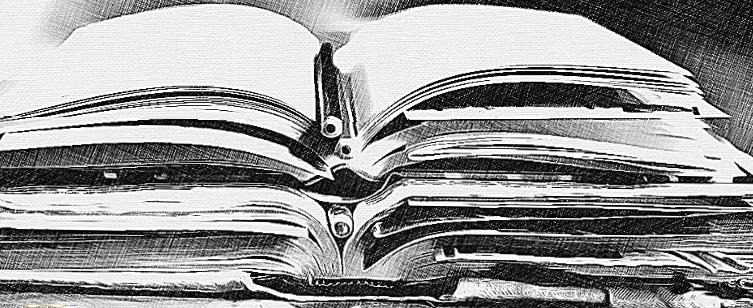칠정(七情):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칠정(七情,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은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장 훌륭한 성인이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기쁨으로 말하면, 부모가 장수하고 안락하면 기뻐할 만하고, 현명한 스승과 보탬이 큰 벗을 얻으면 기뻐할 만하며, 현명한 아내와 자손이 있으면 기뻐할 만하다. 안으로 나의 마음을 반성하여 남에게 말 못할 것이 하나도 없거나 나의 일을 점검하여 의리에 큰 괴리가 없으면 기뻐할 만하니 이것이 정당한 기쁨이다.
그러나 기쁨이 마음에 더해져서 나만 홀로 차지하려는 뜻이 있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곧 사사로운 마음이 되고, 도리어 기쁨이 넘쳐 부정한 데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 실제가 없는 명성이나 재주가 없는 귀함, 덕이 없는 부유함 등은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고 혹시 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전혀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 그에 대한 걱정이 곧바로 이를 것이다.
분(忿, 성내다, 원망하다)과 온(慍, 성내다,번민하다, 원망하다)은 모두 노(怒)의 종류이다. 그렇지만 외물이 나의 사사로움과 접촉하여 조급하게 발동하는 것이 분(忿)이고, 마음속에 유감을 품고 있으면서 삭이지 못하는 것이 온(慍)이다. 조급하게 발동하면 사나워지고, 유감을 품고 있으면 화기를 상하게 된다. 분과 온은 가장 깊이 경계하여 극복하고 제거해야 한다. 분온(忿慍)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남을 헤아리는 마음일 것이다.
슬픔이란 죽음에서 주로 발동한다. 그렇지만 부모의 상(喪)이나 자손의 죽음은 그 슬픔이 곧 천리(天理)에 지극히 정당한 애통함이지만, 만약 사사로운 정으로 슬퍼했다면 대순(大舜)은 고수(瞽瞍)의 상(喪)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공자는 백어(伯魚)의 죽음에 실명했을 것이다. 성인은 마음에 천리를 온전히 하니, 상사(喪死)를 당하면 지성으로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 슬퍼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슬퍼지므로 슬픔을 다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슬픔을 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슬픔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예(禮)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한다.”라고 했으니, 마음에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쌓이고 성의가 극진하면 슬픔이 지극해진다. 마음속에 성실하여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곡을 하니, 이것이 천리가 바른 것이다. 불초한 사람은 마음의 덕이 온전하지 않고 성의가 극진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애써서 이르러야 한다. 애써서 이른다는 것은 슬픔을 생각해서 슬픔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용》에서 말한 ‘사성(思誠)’이고 맹자의 ‘회복했다.〔反之〕’는 뜻이다. 거문고를 타다가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못 내거나, 공자가 모두 군자라고 불렀던 것이 이것이다. 사사로운 생각이 슬픔에 더해진 경우, 사사로움에 집착하면 목숨을 잃거나 실명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비슷하기라도 하지만, 사사로움에 얽매어 천성을 잃은 자가 남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짓이다.
오복(五服)의 슬픔은, 슬프다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의 정은 천리의 당연한 슬픔이 있는 경우가 드무니, 또한 슬픔을 생각해야 한다. 슬픔을 생각하면 감정이 모이며, 감정이 모이는 것이 천리의 본연이다. 감정이 모여 슬픔이 지극해지면 곡을 하니, 슬픔이 지극하지 않은데 곡을 하는 것은 허위이다. 공자는 “이유가 없는 눈물을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성인은 잠깐 사이의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허위가 없었으니, 이것이 성인이 된 이유이다.
공자가 옛 숙소 주인의 상에 곡을 하면서 매우 슬퍼하여 참마(驂馬)를 풀어서 부의했다. 공자는 열국(列國)을 두루 다녔으니 천하 거의 모든 곳에 숙소 주인이 있었던 셈이지만, 반드시 다 곡을 하고 부의를 하지는 않았다. 성인이 한때를 묵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여 숙박했으니, 숙소 주인이 현명했다면 그가 죽었을 때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한 번 숙박한 정에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음에랴. 만일 숙소에 슬퍼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성인이 어찌 허위로 슬퍼했겠는가. 또한 만일 자로가 돌아가 만나 보았더니 지팡이로 대그릇을 메었던 장인(丈人)이 죽었다면 자로의 곡이 어찌 친척을 잃은 슬픔 정도에 그쳤겠는가. 돌아와 공자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다면, 공자의 슬픈 눈물이 어찌 곡 같은 정도에 그쳤겠는가.
즐거움에도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있다. 군자의 즐거움은 그 이치를 즐거워하는 까닭에 즐거움이 공정하고 넓으며, 소인의 즐거움은 자기 일만 즐거워하는 까닭에 그 즐거워하는 바가 자기 한 사람의 사사로움일 뿐이다. 순 임금이 노래를 지었던 즐거움, 고요(皐陶)가 이어서 노래를 했던 즐거움, 문왕이 훌륭한 여자를 얻은 즐거움, 북과 종소리가 천자에게 들리는 즐거움, 공자와 안연이 고치지 않았던 즐거움이나 벗이 찾아왔던 즐거움, 맹자가 말한 삼락(三樂)의 즐거움 등은 모두 천리의 공정하고 넓은 즐거움이다. 그 때문에 즐거움이 하늘에 닿고 땅에 서렸다가 사람에게서 극진하게 된다.
그러나 소인의 즐거움은 요행히 부귀를 얻어 즐기고,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소리와 여색을 즐기며, 방자하고 교만하며 나태하여 안일하게 놀면서 자기 일신의 환희를 끝까지 누리다가 천지에 거스르고 인정을 어긴다. 그 폐해의 흐름은 걸주(桀紂)가 소처럼 마시고, 불에 달군 쇠기둥을 건너게 했던 즐거움이 되고, 심지어 주찬(朱粲)이나 진종권(秦宗權)의 무리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즐거움에 이르게 된다. 천하의 재앙은 자기 일신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작게는 몸을 망치고 크게는 나라를 망치는 것이 바로 모두 이것이다.
사랑은 천지의 본심이다.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사랑은 심덕(心德)의 본체가 되며, 오성(五性) 중에 인(仁)에 속하고, 오륜(五倫) 중에는 부자(父子) 관계에 속한다. 그래서 부자 사이의 친함은 사랑을 주로 하고, 인의 실천은 효(孝)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미루어 우애와 공경이 되고, 미루어 친척까지 화목하게 된다. 더 미루어 고을과 국가에 이르러서는 백성에게 어질게 되며, 또 미루어 만물을 사랑하니, 그 근본은 사랑의 이치일 뿐이다.
그러나 인의 체용(體用)을 궁극적으로 논의해 보면 애(愛) 한 글자로는 비록 감당하기 부족하지만, 사랑이라는 글자를 빼놓고는 따로 인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찾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 사랑의 도(道)가 크다.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여 자기 마음에만 더하게 되면 작은 사랑이 되어 완전히 사사로운 의도가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천지인(天地人)의 본심을 해쳐서 크게 재앙이 된다. 만약 처첩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녀 사랑에 푹 빠지며, 소인을 무람없이 사랑하면, 몸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며 천하를 망친다. 대체로 사랑에 가리는 경우는 모두 사랑 때문에 나쁜 점을 모를 때이다. 사랑하면서도 나쁜 점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 되는 방법이다.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그 잘못을 간하지 않으면 큰 불효이다. 하루에 세 마리의 희생을 써서 봉양한다고 해도 오히려 어버이를 해치는 자가 될 것이다. 자손을 사랑하면서 그 잘못을 알지 못하면 핥고 안고 배불리고 따뜻하게 해 주어도 이는 그 자식을 해칠 뿐이다. 더구나 처첩을 사랑하여 그 나쁜 점을 감싸 주는 자는 달기(妲己 은나라 주(紂)의 비)나 포사(褒姒 주나라 유왕(幽王)의 비)를 방 안에서 데리고 사는 자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어 어둡게 하는 데는 사랑이 가장 심하다.
만약 어버이를 사랑하면서 나의 부모라고 생각해서 사랑한다면 사심이지 효가 아니다. 이는 그저 나를 낳고 길러 주신 수고로운 은혜와 천리의 당연한 법칙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니, 사랑에서 공경심이 생기고 공경심에서 봉양하려는 마음이 생기며, 봉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효가 완성된다. 사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효를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사사로움을 중시하는 자는 항상 망할 것이니, 이치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한 까닭이다.
자손을 사랑하면서 나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한다면 그 폐해가 더욱 크고 자손이 반드시 불초하게 된다. 오직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이치로 기르고 성취시켜 그 인생에 욕됨이 없게 한 뒤에야 참된 사랑이다. 더구나 처첩은 잠자리에서의 사사로움 때문에 그 사랑이 더욱 친밀해져 천하에 다시는 내 처첩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니 어찌 그 재앙이 끝이 있겠는가. 배우는 사람은 절도에 맞는 사랑을 하려고 해야 하며, 더욱 아집을 없애야 한다.
두려움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경우와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횡역(橫逆)과 참언, 밖으로부터의 재앙과 위세나 무력, 귀신과 괴이한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경우이다. 몸을 수양하지 않고 행동에 잘못이 있는 것, 배움이 나아가지 않고 이치에 막힘이 있는 것, 육친(六親)에게 불화가 있고 마음과 의지에 불성실한 데가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이다.
만일 몸을 닦고 행동이 순수하며, 배움이 나아가고 이치가 밝으면, 육친이 화목하고 마음과 의지가 성실해질 것이다. 횡역이나 참언, 위세나 무력은 다른 사람에게 달린 일이니, 내가 왜 남을 대신하여 두려워하는 수고를 하겠는가. 밖으로부터의 재앙은 운명이 있으니 그 바른 운명을 순순히 받을 뿐이며, 귀신과 괴이한 일은 이치가 밝아지고 뜻이 성실해지면 더욱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본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도(道)를 아는 사람은 평생 해야 할 걱정이 있다. 전전긍긍하면서 깊은 연못에 서 있는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망할까 망할까 하면서 죽은 뒤에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명(命)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니,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관청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이유 없이 복(福)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재주가 없는데도 관직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위험한 담장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맨손으로 범에게 덤비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는 일을 두려워하니, 자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욕구라는 정(情)은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욕구는 성현보다 큰 사람이 없다. 천지와 그 덕을 합하려고 하고, 일월(日月)과 그 밝음을 합하려고 하며,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하려고 하고, 만물로 하여금 각각 자기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며, 육합(六合) 안이 모두 자신의 덕택을 입게 하려고 하고, 몸과 이름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러도 추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완성한 사람이 있으니, 순 임금은 요 임금의 천하를 받고도 상관하지 않았고, 공자는 거친 밥과 물을 먹고 팔을 베고 자면서도 근심하지 않았으며, 시퍼런 칼날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욕구보다 좋지 못한 것은 없다. 배불리 먹으려고 하고 따뜻하게 입으려고 하며, 미색을 가지려고 하고 편안히 놀려고 하며, 자신이 그르다고 하지 않길 바라고 권력이 자신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기를 바라고 노력 없이 행여 부귀가 오기를 바라며, 만복이 다 자신에게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심지(心志)를 다 바치고 이목을 다 동원하여 장생하고자 한다. 고금에 혹시라도 그런 욕구를 채운 자가 있었던가? 그 반만 욕심 부려도 몸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며, 그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 나라를 망치고 천하를 망쳐서 들창 아래서 목숨을 보전하고 죽음을 맞이한 자가 드물었다.
만에 하나 요행히 면하더라도 만고에 치욕스런 존재가 되어 소 돼지만도 못한데 장차 그 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욕심은 재앙을 바라는 것이니, 다름이 아니라 욕구가 마음에 더해져서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 자는 선하게 될 수도 악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따라 욕심이 되면 어디를 가도 좋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 처해도 패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경》에 “인심은 위태롭다.”라고 했는데, 위태롭다는 말은 잠깐 실수하면 골짜기에 떨어지고, 공경하여 잡으면 편안하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욕구는 형기의 마음에서 발동하니, 공경하지 않으면 욕심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욕심이 추하기로는 똥구덩이나 진흙탕보다 심하며, 욕심이 두렵기로는 만 길 구렁텅이보다 훨씬 심하다. 한번 더럽혀지면 씻을 수 없고, 한번 빠지면 살아나올 수 없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 「존재집(存齋集) 제13권/ 잡저(雜著)/ 격물설(格物說)/ 사물(事物)」 중에서 부분-
▲원글출처: 한국고전번역원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오항녕 (역) ┃ 2013
'고전산문 > 존재 위백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인배가 무리를 이루면 도깨비외에는 모두 죽일수 있다 (0) | 2017.12.21 |
|---|---|
| 의미를 취하되 문장을 흉내내지 않는다 (0) | 2017.12.21 |
| 팔창(八娼)ㆍ구유(九儒)ㆍ십개(十丐) (0) | 2017.12.21 |
| 벗에 대하여 (0) | 2017.12.21 |
| 편벽됨을 치유하는 방법은 서(恕)뿐이다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