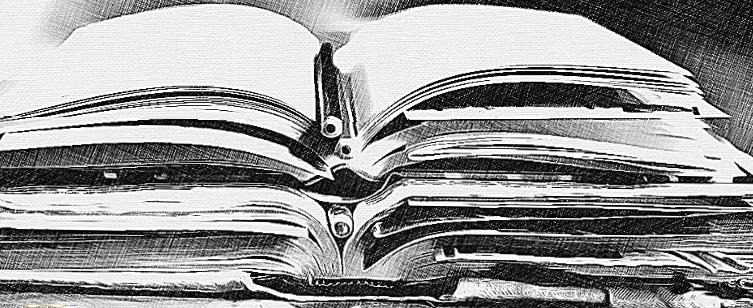소인배가 무리를 이루면 도깨비외에는 모두 죽일수 있다
소인(小人)은 벗(마음을 같이하고 의리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은 없지만 당(黨, 자기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로 모인 무리)은 있으며, 군자는 벗은 있지만 당(黨)은 없다. 그런데 소인은 당(黨)이 많을수록 더욱 세력을 확장하고, 군자는 항상 소인의 당(黨)에 화를 당하는 것은 왜인가? 위에 있는 사람은 늘 받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소인이 거기에 영합해서 아첨하며 기쁘게 해 주기 때문에 군주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많으니까 더욱 기뻐하면서 소인의 당(黨)이 하늘에 이를 정도로 악행이 커지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군자는 늘 귀에 거슬리게 비판하는 말을 아뢰기 때문에 군주가 처음에는 꺼리고, 오래 꺼리다 보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참고 용인하다가 군자가 벗이 많은 것을 보기에 이르면 왼편에서는 경계(警戒)하고 오른편에서는 규간(規諫,옳은 도리로써 임금이나 웃어른의 잘못을 고치도록 말함)하여 자신이 군주가 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될까 걱정한다. 군주의 뜻이 게을러지고 눈썹을 찌푸리게 될 무렵에, 소인들이 틈을 타서 붕당(朋黨)이니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마치 불을 붙이려다 마른 나무를 만난 듯 화들짝 크게 놀라 이 무리가 정말 붕당이라서 나를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발끈 크게 화를 내며 이 무리가 정말 붕당이라서 나로 하여금 마음먹고 있는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없게 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묵은 분노가 이를 기화로 터져 나오고 참언이 빠르게 나돌면서 이응(李膺)이 정말 크게 무도한 사람이 되고, 사마광(司馬光)이 간사하다고 하는 말에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민(閩) 땅 주자는 정말 부박한 무리의 영수(領袖)가 되었다(아래 역자註 참조). 당시 군주들은 스스로 나라의 역적들과 피를 나누는 당(黨)이 되었으니, 그들의 당(黨)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자들을 죽이고 금고(禁錮)했던 것은 본디 당연한 일이었다. 비록 군주를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해도 어떻게 내가 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군자가 소인을 배척할 때, 비록 소인의 붕당(朋黨)을 알고 있더라도 오히려 말을 하다가 죄를 받으며 장래의 일을 미리 짐작하지 않는다. 당(黨)이라는 한 글자로 아울러 섞어 공격하여 수종(首從, 주동자와 따르는 자)을 구분하지 않고 옥석(玉石)이 함께 타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관대하게 용인해 준다.
소인이 군자를 재앙에 빠트릴 때는 천지 사이에 맑고 밝은 씨가 있어서 세상이 긴 밤처럼 되지 못하게 할까 걱정하는 까닭에 도깨비 외에는 모두 죽일 수 있다. 만일 수염이 없는 자를 보고 잘못 죽인 경우(나라를 어지럽히는 부패한 환관을 처단하다가 오인하여 무관한 사람까지 숙청하는 실수)가 있어도 더욱 크게 통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가 산하(山河)에 뿌려지고 해와 달이 불에 타더라도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다. 논자(論者)들은 마침내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경계하니, 그와 같은 짓은 반드시 인간들 모두가 파리나 개가 되어 치질을 빨아 주면서 배불리 먹고 구더기 굴에서 즐겁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혀를 묶고서, 그림자나 자취도 없이 피하여 숨어 살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온전히 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 저 파리와 개는 따질 것도 없지만, 다행히 만물의 영장으로 요순(堯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禹)와 문왕(文王)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머리를 두려워하고 꼬리가 위축되어,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도 난(蘭)을 삼키고 뱉지 않으며, 어린아이를 버려 두고 처음 물어보아도 알려 주지 않고(옮긴이 註: 원문은 遇同心而呑蘭不吐 우동심이탄난불토 棄童蒙而初筮不告 기동몽이초서불고, 즉 문맥상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향기로움이 난초같다고 삼키고 아니면 토하거나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처음 묻던 반복해서 묻던 간에 내치지않고 성실히 가르쳐 준다'로 이해함이 합당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라니와 사슴이 있는 골짜기에서 죽기를 기다린다. 누가 차마 이렇게 하는가? 누가 차마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학도들을 보내라고 벗이 권했는데도 우리 주자가 끝내 차마 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나는 다만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부끄럽지 않으니, 하늘을 어떻게 하겠는가? 공자가 “나를 아는 것은 아마 하늘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늘이 과연 공자를 알아주었는가? 하늘이 과연 공자를 알아주었는가? 현인(賢人)이 모이고 덕성(德星 목성, 현인)이 모인 것을 보니, 하늘도 동한(東漢)의 군자를 알았다고 하겠다.
<역자 註>
1. 이응(李膺): 동한 말엽에 환관(宦官)들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므로, 환제(桓帝) 때에 진번(陳蕃)ㆍ이응 등이 이를 미워하여 공박했는데, 환관들은 도리어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하여 종신토록 금고(禁錮)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당고(黨錮)의 변이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2. 사마광(司馬光) : 송(宋)나라 철종(哲宗) 때 사마광이 재상이 되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폐지하고 구법을 회복시켰다. 그 후 장돈(章惇)과 채경(蔡京)이 차례로 재상이 되어 다시 왕안석의 신법을 환원하고 사마광을 비롯하여 문언박(文彦博)ㆍ소식(蘇軾)ㆍ정이(程頤) 등 120인을 간당(奸黨)으로 지목하여 원우간당비(元祐奸黨碑)를 세우고, 다시 사마광 이하 309인을 기록하여 원우당적비(元祐黨籍碑)를 세웠다. 《宋史 卷19 徽宗紀》
3. 민(閩) : 한탁주(韓侂冑) 등이 주자의 학문을 ‘도학(道學)’이라고 해서 금지했던 위학(僞學)의 금(禁)을 가리킨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 '붕당(朋黨)', 존재집(存齋集) 제14권/ 잡저(雜著)/ 격물설 상론(格物說 尙論)-
▲원글출처: 한국고전번역원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오항녕 (역) ┃ 2013
'고전산문 > 존재 위백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의(誠意)와 스스로 속임(自欺) (0) | 2017.12.21 |
|---|---|
| 뜻을 고상하게 가져라 (0) | 2017.12.21 |
| 의미를 취하되 문장을 흉내내지 않는다 (0) | 2017.12.21 |
| 칠정(七情):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0) | 2017.12.21 |
| 팔창(八娼)ㆍ구유(九儒)ㆍ십개(十丐)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