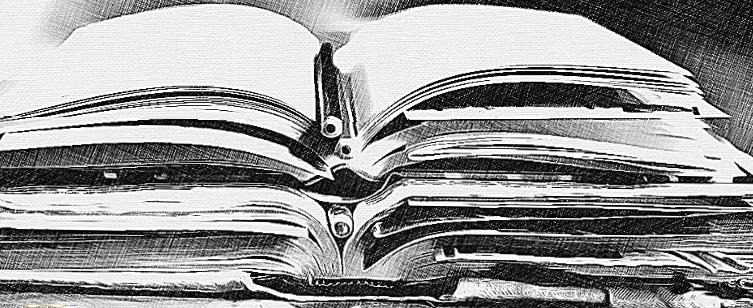뜻을 고상하게 가져라
선비는 뜻을 고상히 하는 자이다. 뜻이 고상하면 식견도 고상하고 문장도 고상하지만, 뜻이 저속하면 식견도 저속하고 문장도 저속하다. 이른바 고상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꼿꼿하여 잘난 체하고 건방지다는 말이 아니라,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군자의 무리가 되려는 것이다.
낙(洛 정자)ㆍ민(閩 주자)을 비롯한 여러 선생이 성학(聖學)으로써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근래에는 오로지 과거로써 선비를 취하면서 선비가 과거 공부를 익히지 않으면 벼슬하여 군주를 섬길 길이 없으므로 과거 문장을 아울러 공부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
대개 식견이 고상하면 독서할 때에 반드시 의리를 궁구하고, 완미하며 깊이 사색하고 이치를 탐구하여 밝히며, 말로 표현하지 않은 뜻까지 곱씹어 음미하여 자구(字句)의 요지를 두루 통달한다. 경서(經書)를 읽을 경우에는 요순으로부터 공자ㆍ맹자에 이르기까지 얼굴을 직접 대면하듯이 하고 구결(口訣)을 받들 듯이 하며, 마음으로 이해하고 뜻을 통달하여 아홉 성인의 언어가 하나로 관통하고, 본래 이취(異趣, 색다른 뜻이나 느낌)가 없어서 혈맥이 관통하고 의리가 융합한다.
문장가들의 문장을 읽을 경우에는 《춘추좌씨전》, 《국어(國語)》로부터 아래로 양한(兩漢)을 겸하여 당송(唐宋)에 이르기까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주제를 완미하고 자신을 그 상황에 처한 것으로 설정하여, 당시의 상황과 풍미(風味)와 곡절(曲折)을 마치 화공(畫工)의 전신(傳神)이나 조장(雕匠)의 조각상을 보듯이 이해한다면, 허다한 편(篇)과 장(章)의 서술ㆍ핵심ㆍ끝맺음이 오묘하리만치 정태(情態)를 극진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장자(莊子)와 사마천(司馬遷)의 글을 읽을 때에는 자신이 곧 장자와 사마천이 되고,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글을 읽을 때에는 자신이 곧 한유와 유종원이 된 후에야 문장가의 오묘함을 터득할 수 있다.
이미 경서로써 근본을 삼고 또 뛰어난 문장가들을 우익(羽翼)으로 삼으면, 문장으로 표현할 때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답게 된다. 이는 곧 성인이 말을 하면 그대로 경(經)이 되고, 입만 열면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간직되어 있는 것이 이미 뛰어나면 비록 변체(變體)로써 주사(主司 과거 시험관)의 눈에 들려고 더 이상 힘쓰지 않더라도 시부(詩賦)ㆍ의의(疑義,경서를 주제로 한 논문)ㆍ표책(表策, 요즘 말로 하면 정부 행정용 시무요식을 갖춘 관용글)ㆍ서문(序文)ㆍ기문(記文)ㆍ간찰(簡札, 소식이나 안부, 의사등을 전하는 편지) 등에 대해 한 귀퉁이를 들어주면 네 귀퉁이를 모조리 통달하고 좌우에서 취하여 씀에 그 근원을 만나게 된다.
이와 같으면 어느 때인들 합당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과거인들 합격하지 않겠는가. 문장이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 가운데서 저절로 우뚝 빼어나게 될 것이다.
도학(道學)과 과거 공부가 언제 일찍이 두 갈래였던가. 정자와 주자가 그러함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자제(子弟)와 문생(門生)들을 모두 이 방도로써 가르쳤으니, 속언에 이른 바 학을 타고 양주(楊州) 고을의 원님이 되는 방법인 것이다. 만약 정자와 주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만이다. 그러나 진실로 현철(賢哲)이라면 그들의 말은 분명 사람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본디 모두 뜻과 식견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뜻이 이미 저속하고 식견도 자연히 저속하다. 경서(經書)와 백가(百家)의 글을 읽을 적에 애당초 글의 뜻을 깊이 생각하여 찾지 않으며, 자구(字句)도 자세하게 음미하지 않는다. 경서 언해는 모두 선현대가(先賢大家)의 손에서 이루어져 그 세밀한 분석이 마치 신묘한 화공(畫工)의 솜씨 같은데도, 전적으로 대충 거칠게 읽고 외워서 다만 자구나 따다 쓰는 용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음(音)과 토(吐)에 대해서 이미 왜 그렇게 달았는지를 살피지 않으니, 하물며 그 뜻풀이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는가?
애당초 생각을 기울여 깊은 뜻을 찾지 않고, 아울러 성현의 글은 모두 성리학을 위해 지은 것이지 원래 과문(科文, 과거시험용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가슴에 가로놓여 있어서 식견이 더욱 낮아진다.
문장가들의 문장에 대해서 진한(秦漢) 이전의 문장은 비둘기가 구만 리를 날으는 붕새를 바라보듯이 하고, 다만 한유(韓愈)ㆍ유종원(柳宗元)ㆍ구양수(歐陽脩)ㆍ소식(蘇軾) 이후의 문장은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 으레 정한 양대로 외우기만 하니, 문장가의 오묘함을 언제 꿈속에서나마 보았겠는가?
이러한 수준에서 문사(文詞)를 지으니 그 거칠고 엉성함은 진실로 이상할 것이 없다. 시를 익히는 자가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일곱 글자를 모아 맞추노라면 검은 귀밑머리가 모두 백발이 되고 하얀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 간다. 그러다가 운명이 통하지 않으면 실의에 빠져 스무 살 전에 노유(老儒)가 된다.
그러면 또 목표를 바꾸어 여섯 글자 글짓기를 배우는데, 고심하고 애쓰기는 시와 매일반이지만, 초장(初場)에 잘 안되면 경의(經義 오경의(五經義))를 배운다. 또 시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경의에 뛰어나지 못하면, 또 목표를 서의(書義 사서의(四書義))로 바꾸어 마음과 기운을 다 소진하면서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백 살도 못 사는 인생을 과거 시험장에 팔아먹게 되니 고뇌의 심함이 이와 같다. 몸이 나무나 돌이 아닐진대 어떻게 지탱하겠는가. 근본을 반성하며 깨달을 줄 모르니 진실로 슬프다.
그 근본은 모두 뜻이 저속하고 식견이 저속해서 그런 것이다. 뜻이 저속하기 때문에 자신을 닦고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감히 군자가 되려고 스스로 기약하지 않고, 문장을 지으면서도 반드시 “문장이 좋은들 어찌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다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한다. 애당초 크게 바라는 것이라고는 순제(旬題, 일종의 과거시험용 능력테스트로 관에서 열흘에 한번 글제를 내어 시험보는 것)ㆍ백일장ㆍ도회(都會, 향촌의 유생들이 모두 모여 문장의 기량을 시험하는 행사)에 있다. 합격하면 천손(天孫 직녀성(織女星))이 운금(雲錦)의 치마를 짜 준 듯이 기뻐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구걸하는 아이가 깨진 표주박을 잃은 듯이 슬퍼한다.
또 백일장에 여러 번 합격한 문장이라도 향해시(鄕解試)나 회시(會試)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하면 필경 미쳐서 본성을 잃게 된다. 스스로 포기하여 서른 살이 되기도 전에 궁상맞은 상(相)이 되고, 서책을 던져버리고 필묵(筆墨)을 원수 보듯이 한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팔짱 끼고 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낸 자이고 보니 밭 갈고, 김매고, 채소밭을 가꾸고, 흙을 모아 북돋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평생 글을 잘못 읽은 자이고 보니 소지(所志)나 서간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옮긴이 주: 향해시, 회시는 지방이나 중앙에서 1차로 보는 과거시험을 뜻한다. 회시는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향해시는 찾기가 힘들다.여튼 둘다 1차시험으로 사료된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가 느닷없이 시골 아이들의 훈장이 되니, 공중에 ‘광주리를 잃었네, 게를 잃었네.〔失筐失蟹〕’라는 네 글자를 쓰는 데 불과하다.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니 진실로 슬프구나, 진실로 슬프구나.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병폐가 《지봉유설(芝峯類說)》에 대체로 언급되어 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사족 가문에 재주 있는 자식이 누구에게인가 《맹자》를 천 번 읽으면 문리(文理)를 얻는다는 말을 듣고 산에 들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만독(萬讀)을 채운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부친이 출타 중이어서 사내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에 “읽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안이 무고하여 다행입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록 천만 번을 읽은들 아무 보탬이 없음이 과연 이와 같다.
또 영남의 나이 어린 재사(才士)가 거접(居接)하면서 경치를 음미하며 시를 짓기를 “온 산에 황장이 빼어나고 시냇가엔 묵태가 짙게 드리웠네.〔滿山秀黃腸 臨溪蔭墨胎〕”라고 하였으니, 대우(對耦)가 매우 긴밀하다. 그러나 송판의 이름으로 소나무 이름을 삼고 고죽군(孤竹君)의 성(姓)으로 푸른 대나무를 표현하였으니,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과연 이와 같았다.
또 시체(時體)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주제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우에만 힘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 ‘볍씨를 뿌린다〔種稻〕’는 연구(聯句)를 짓기를 “소가 흙을 뒤집어 흰 물의 논을 갈고, 새가 점점이 푸른 하늘을 나네.〔牛翻白水耕 鳥點靑天飛〕”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말한 ‘소가 논을 가는〔牛耕〕’ 것은 주제인데 새가 나는 것을 낙구(落句)로 삼았으니, 대우는 비록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볍씨를 뿌린다는 본래 주제는 어디에 버려두었는가?
무릇 시부(詩賦)와 의의(疑義 과거 시험문제의 일종)는 다만 아는 글자만을 모은다. 주제 내용의 미묘함을 연구하지 않은 자는 실제 의미를 붙여 문장을 기술할 곳에 의미 없는 말로써 단지 연속해서 사실만 서술한다. 예컨대, ‘옛적 어린아이가 학을 잃고〔古兒失鶴〕’라는 연구(聯句)를 지었는데 “오늘 아침 가을바람 세차게 불어 집의 학이 날아가 버렸네. 새장을 열어 보니 학 똥만이 새장 속에 말라 있네.〔今朝秋風大吹 家鶴飛走 開籠視之 鶴糞燥在籠中〕”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 서사가 정밀하고 자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문장인가?
또 어떤 늙은 재상이 있었는데 그의 벗이 외아들을 잃자, 과거에 합격한 제 자식에게 조문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자식이 돌아오자 “아무개의 정황이 어떠하더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매우 참혹하였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라고 하였다. ‘낙루(落淚)’ 두 글자가 과연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형용하는 것인가. 오늘날 온 세상의 백일장만 쫓아다니는 선비들 가운데 이러한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거의 드무니, 진실로 통탄스럽고 애석하다. 어찌 ‘얻은 영웅이 모두 흰머리의 늙은이’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현감(縣監)인 내가 비록 보잘것없으나, 어려서부터 뜻을 세움이 구차하지 않아 반드시 제일의 군자가 되고자 하였고, 식견이 구차하지 않아 반드시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기약하였다. 성인(聖人)의 경전을 읽을 때면 반드시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기를 마치 성인의 말씀을 직접 듣는 듯이 하여, 그 뜻을 곰곰이 씹어 가며 맹렬히 궁구하여 글자와 문장을 환하게 이해하였다.
처음 공부의 시작은 《소학》을 모태로 삼고, 《중용》, 《대학》, 《논어》, 《맹자》에서 몸을 극진히 하였으며, 《주역》, 《시경》, 《서경》에서 온 힘을 다하였다. 《의례(疑禮)》, 《예기》, 《가례(家禮)》 등의 책으로 큰 쓰임을 도왔고, 장자(莊子)ㆍ열자(列子)ㆍ반고(班固)ㆍ사마천(司馬遷)ㆍ한유(韓愈)ㆍ유종원(柳宗元)ㆍ구양수(歐陽脩)ㆍ소식(蘇軾) 등 여러 문장가들을 두루 섭렵하여 춘추 이후 송원(宋元) 20대(代)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였다.
그 나머지 소소한 소가(騷家)와 시가(詩家)는 두루 보고 외우면서 익히지 않은 것이 없었고, 사방으로 불서(佛書)ㆍ병가(兵家)ㆍ도가(道家)ㆍ의가(醫家)ㆍ담명가(談命家 사주)ㆍ감여가(堪輿家 풍수지리)에까지 두루 미쳤으며, 소설패사(小說稗史)에 대해서도 모두 섭렵하여 그 대의(大義)를 통달하였다.
드러내어 문장을 지으면 곡진하거나 정묘하지는 않더라도 과거 문장의 여섯 문체와 의송(議送)ㆍ소지(所志)ㆍ서문(序文)ㆍ기문(記文)ㆍ시(詩) 등의 문체를 모두 하나로 관통하여 깨달아 형식에 따라 대강은 그릴 수 있다. 다만 마음에 바라는 것은 과거 합격 여부에 급급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극진히 하면서 저 푸른 하늘이 명하는 바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 문장을 본 세상 사람들은 내 문장을 매우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않고 문장을 잘 짓는다고 칭찬한다. 헛된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쳐 외람되이 궁궐에까지 알려져서, 성은(聖恩)이 분수에 넘치도록 우악(優渥)하여 나이 70의 늙은 선비가 이 고을의 수령이 되었으니, 돌이켜 보면 마음에 부끄럽고 머리를 들면 하늘에 부끄러워서 감히 나서서 사람들과 편안히 말을 나누지 못하였다.
게다가 기운이 쇠약하고 정신이 어두운 데다 현명함도 위엄도 없고 엄격하지도 철저하지도 못하여, 현감으로 부임한 지 2년 동안 우두커니 앉은 채로 바보가 되어 한 명의 아전도 깨우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백성도 가르치지 못했으며, 하나의 송사(訟事)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위로는 임금의 은혜에 죄를 짓고 아래로는 백성의 기대를 저버렸다.
한밤중에 생각해 보니 부끄러워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은 병이 깊고 가을도 다가와 돌아갈 시기가 멀지 않았다. 경내(境內)의 여러 군자들이 나를 독서하는 동류(同類)로 여겨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서로 뜻과 식견이 저속한 근래의 습속에 빠져서 평생을 잘못 보내고 세월을 허비할까 염려되어 감히 보잘것없는 말을 하였다. 공손히 그대들 공부하는 자리에 올리니, 삼가 채택하기를 바란다.
[역자 주]
1.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왕자 점(墊)이 선비는 무엇을 일삼는지를 물었을 때 맹자가 선비는 “뜻을 고상히 한다.〔尙志〕”라고 대답하였다.
2. 아홉 성인 :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黃帝)ㆍ요(堯)ㆍ순(舜)ㆍ우(禹)ㆍ문왕(文王)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를 말한다.
3. 화공(畫工)의 전신(傳神) : 화가가 대상물의 정태(情態)를 핍진하게 그려 내서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진(東晉)의 화가였던 고개지(顧愷之)가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는데, 그는 간혹 사람만 그려 놓고 수년 동안 눈동자를 그리지 않기도 했다.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사지 육체의 잘생기고 못생김은 본디 오묘한 곳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정신을 전하는 진실한 묘사는 바로 눈동자 속에 있는 것이다.〔四體姸蚩 本無關於妙處 傳神寫照 正在阿堵中〕”라고 하였다. 《世說新語 巧藝》
4. 한 귀퉁이, 네 귀퉁이 : 《논어》 〈술이(述而)〉에 “한 귀퉁이를 들어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은 세 귀퉁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아야 한다.〔擧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 학을 타고 양주의 고을원님이 되다 : 남조 양나라의 은운(殷芸)이 지은 《은운소설(殷芸小說)》에 있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옛날에 몇 사람이 모여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양주 고을의 원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재물이 많기를 바란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허리에 십만 냥의 돈꿰미를 두르고서 학을 타고 양주 고을의 원님이 되고 싶다.〔腰纏十萬貫 騎鶴上揚州〕”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6. 광주리 :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베를 짜는 누에에게는 광주리가 없고 필요 없는 게에게 광주리가 있으며, 갓을 쓰고 있는 벌에게는 갓끈이 없고 필요 없는 매미에게 갓끈이 있다.〔蠶則績而蟹之筐 范則冠而蟬有緌〕”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는 목표와 수단을 다 잃고 나이만 들어 한탄하는 의미로 쓰였다.
7. 지봉유설(芝峯類說) : 《지봉유설》 권16 〈어언부(語言部) 해학(諧謔)〉에 나온다. 유필(柳滭)이라는 자가 《맹자》를 3천 번을 읽고도 글 뜻을 해득하지 못해서 남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존해 있는 자기 아버지를 선군(先君)이라고 일컬었다는 이야기와, 의관(醫官) 김 아무개가 출타 중에 있는 아버지에게 조모(祖母)의 부음(訃音)을 알리면서 “집안에 아무 일 없지만 조모가 돌아가셨으니 한스럽습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8. 황장, 묵태 : 황장은 나무의 중심 부분이 단단하고 빛깔이 누런 황장목을 말하고, 묵태는 고죽군(孤竹君)의 성이다.
9. 흰머리의 늙은이: 당(唐)나라 시인 조하(趙嘏)의 시에 “당나라 태종황제 장구한 계책을 세웠으나, 얻은 영웅은 모두 흰머리 늙은이였네.〔太宗皇帝眞長策 賺得英雄盡白頭〕”라는 구절이 있다. 당나라에 늙어 죽을 때까지 진사과(進士科)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았음을 비평한 시이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27》
-위백규(魏伯珪, 1727~1798), '읍의 제생을 깨우치는 글〔諭邑中諸生文〕', 존재집 제18권/ 잡저(雜著)-
**옮긴이 주: 정조(1796년)는 평생 향리에 은거하여 학문연구와 저술,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던 위백규선생의 학문과 덕망을 인정하고 흠모하여 칠순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선생에게 옥과현감에 어명으로 발령한다. 잠시 현감으로 지내던 당시에 관내의 젊은 유생들의 현실과 실체 그리고 구조적으로 왜곡된 세태를 한탄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쓴 칠순 노구 대학자의 진정어린 권면과 충고의 글이다. 선생이 공부를 했다고 스스로도 밝힌 바처럼 위에 열거한 수많은 고서, 문헌들은 전부 기송(암송)하고 그 요체를 이해하여 단순히 옛것을 숭모 답습하지 않고 자기 만의 일가를 이뤄낸 것으로 이름과 문장을 남긴 깨인 옛 선현들도 의당 모두 그러했다. 옛 선현들의 글에서 논하는 독서는, 오늘 날 흔히 아는 단지 읽고 이해하는 독서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모두 기송(記誦, 외우고 그 요체를 기억함)을 기초로 한다. 늙은 선생의 충고에 졸장부에 불과한 나는 많이 부끄럽다. 기록에 따르면 선생은 평생 세속정치와 일신의 영달과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2년이 채 못가 선생은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마쳤다.
▲원글출처: 한국고전번역원/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서종태 (역) ┃ 2013
'고전산문 > 존재 위백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진왜란의 의병(義兵) 김헌(金憲) (0) | 2017.12.21 |
|---|---|
| 성의(誠意)와 스스로 속임(自欺) (0) | 2017.12.21 |
| 소인배가 무리를 이루면 도깨비외에는 모두 죽일수 있다 (0) | 2017.12.21 |
| 의미를 취하되 문장을 흉내내지 않는다 (0) | 2017.12.21 |
| 칠정(七情):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