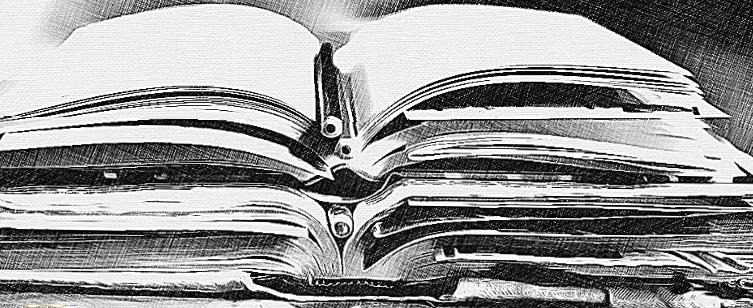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
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안(外眼) 즉 육체의 눈과, 내안(內眼) 곧 마음의 눈이 그것이다. 육체의 눈으로는 사물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는 이치를 본다(外眼以觀物 內眼以觀理). 사물 치고 이치 없는 것은 없다(而無物無理). 장차 육체의 눈 때문에 현혹되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눈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쓰임새가 온전한 것은 마음의 눈에 있다 하겠다.
또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이 교차되는 지점을 가리워 옮기게 되면, 육체의 눈은 도리어 마음의 눈에 해가 된다. 그런 까닭에 옛 사람이 처음 장님이었던 상태로 나를 돌려달라고 원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정재중(鄭在中)은 올해로 마흔 살이다. 40년 동안 본 것이 적지 않을 터이다. 비록 지금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본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보다 많이 보진 못할 것이니, 훗날의 재중이 지금의 재중과 같을 것임을 알 수 있겠다.
다행이 재중은 육체의 눈에 장애가 있어 사물 보는 것을 방해하므로,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만 보게 되었다. 이치를 살핌이 더욱 밝아질 터이니, 훗날의 재중은 반드시 지금의 재중과는 다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눈동자를 찔러 흐릿함을 물리치는 처방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작은 쇠칼로 각막을 도려내 광명을 되찾아 준다고 해도 또한 원하지 않게 되리라. (안대회역)
-이용휴(李用休, 1708∼1782), '정재중에게 주다(贈鄭在中)', 탄만집/집(集)/잡저(雜著)-
▲번역글 출처 및 참조: '고전 산문산책, 조선의 문장을 만나다' /안대회/ 휴머니스트 2008)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탄만집/贈鄭在中
**옮긴이 주
1. 이 글은 이용휴가 나이 40에 실명한 정재중에게 위로차 주는 글이라 한다. 그런데 실명한 당사자의 절망적이고 망연한 심정을 헤아려 마냥 슬퍼하고 동정과 연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둘러서 중심으로 마음을 다둑여주는 위로의 논리, 절망적인 것에서 희망적인 것을 읽어내는 역설의 지혜는 곧 옛 사람의 혜안(慧眼)이라 하겠다.
2. 옛사람의 처음 장님이었던 이야기: 연암 박지원의 글에 '서경덕(徐敬德1489~1546)과 소경의 일화'가 나온다. 내용은 이렇다. 『(난관難關에 봉착할 때)본분으로 돌아가 이를 지키는 것이 어찌 문장에 관한 일뿐이리요. 일체 오만 가지 것이 모두 다 그러하다오. 화담(花潭 서경덕)이 밖에 나갔다가 제집을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우는 자를 만나서 “너는 어찌 우느냐?” 했더니, 대답이 “저는 다섯 살 적에 소경이 되었는데, 그런지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아침나절에 밖을 나왔다가 갑자기 천지 만물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밭둑에 갈림길이 많고 대문들이 서로 같아서 제집을 구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하기에, 선생이 “내가 너에게 돌아갈 방도를 가르쳐 주마. 네 눈을 도로 감으면 바로 네 집이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이에 소경이 눈을 감고 지팡이로 더듬으며 발길 가는 대로 걸어가니 서슴없이 제집을 오게 되었더라오. 눈 뜬 소경이 길을 잃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색상(色相)이 뒤바뀌고 희비(喜悲)의 감정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망상(妄想)이라 하는 거지요. 지팡이로 더듬고 발길 가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분수를 지키는 전제(詮諦)요, 제집으로 돌아가는 증인(證印)이 되는 것이오.』(박지원, '창애에게 주는 두번째 편지', 연암집 5권/영대정익묵)
'고전산문 > 혜환 이용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마땅히 두려워하고 버려야 할 것 (0) | 2017.12.23 |
|---|---|
|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0) | 2017.12.23 |
| 남과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일체이다 (0) | 2017.12.23 |
| 구도(求道)란 생각을 바꾸는 것 (0) | 2017.12.23 |
| 진정한 소유 (0) | 2017.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