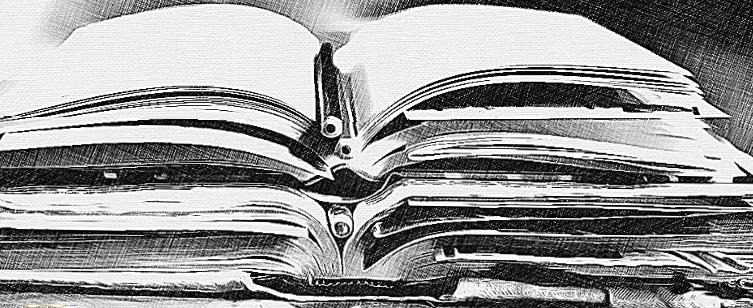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고전산문] 도(道)와 문(文)은 구별해야 한다 / 유한준
Posted by 優拙堂
사마천․반고(사마천은 사기, 반고는 한서, 즉 공통점은 역사서를 저술하였다)의 학문이 정자․주자(정희와 주희,유교에서 성리학을 완성시킨 학자)만 못한 것은 어린애도 알고 있습니다. 학문으로 따지자면 사마천․반고의 문장이 의당 지극하지 못해야 마땅할 듯하지만, 문장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정자․주자의 윗 자리에 있습니다. 정자․주자는 심오한 경지에 이른 자신들의 학문을 가지고도 문장에 있어서 만큼은, 사마천․반고의 아래 자리로 밀려나온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만일 정자․주자의 문장이 사마천․반고의 문장만 못하다고 여겨 그들의 도(道)가 지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한다면, 천하에 그러한 이치란 없습니다. 만약 사마천․반고의 문장이 도(道)에서 이탈한 것이라 생각하여 문장의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