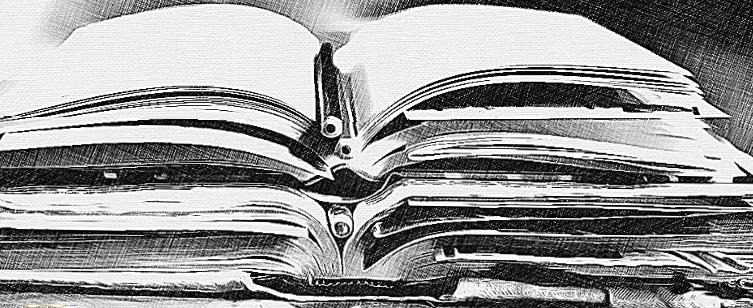[칼럼]방물장수와 어머니 / 강명관
Posted by 優拙堂
은퇴한 지 오래된, 무척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다. 20대 초반 여름 친구들과 어울려 캠핑을 하면서 전국을 주유하던 중 어느 날의 일이었다. 오후 늦게 강가에 텐트를 치며 하루를 묵을 채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초로의 촌로 한 분이 걸음을 멈추고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루를 자고 떠날 요량이라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우리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찌 한데서 재우느냐며 빨리 텐트를 걷고 따라오란다. 실랑이 끝에 못 이기는 체 하고 따라갔더니 마을 공회당 넓은 방에 묵게 해 주고, 저녁까지 차려 주며 ‘없는 찬이나마 든든히 먹으라’고 호의를 베풀더라는 것이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그땐 그랬어, 요즘처럼 야박하지 않았거든. 꼭 그 마을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으니까..